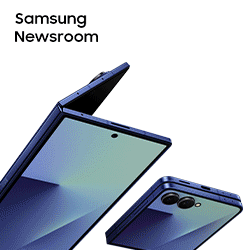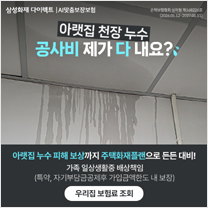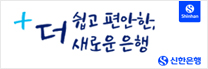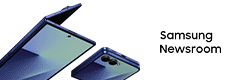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취재수첩] WTI 62달러 기조 유지…소비자 체감 인하는 '갸우뚱'
IEA 공급 과잉 경고…하락장 수혜 온도 낮다는 목소리 여전해
 박상호기자 |
2026.02.19 16:45:57
박상호기자 |
2026.02.19 16:45:57
 (사진=박상호 기자)
(사진=박상호 기자)
국제 유가 60달러대 안착에도 소비자들 "체감 인하 전혀 없다"
WTI 저가 기조 혜택 가로막는 환율·종량세 장벽…기름값 ‘하한선’ 작용
공기업 적자 뒤에 숨은 고금리 늪…매출 늘어도 이자 갚느라 ‘열일’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국제 유가 하락’ 소식은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배럴당 62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이내 고개를 갸웃거린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뉴스의 숫자만큼 빠르게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국제 유가 하락의 온기는 우리 동네 주유소 입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유기 앞에서 마주하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고정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류세 구조는 기름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리터당 매겨지는 고정된 세금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유가가 내려갈수록 전체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는 소비자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대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된다.
환율의 마법 역시 유가 하락의 효과를 증발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원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고,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떨어졌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사 올 때 지불하는 원화 환산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2026년 2월 현재, 한미 양국의 긴축적 동결 기조 속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국제 유가 하락의 혜택이 국내 시장 문턱에서 상쇄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면에는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서글픈 성적표도 자리 잡고 있다. 유가가 내리면 원가 부담이 줄어 실적이 좋아져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과거 탐사·개발 단계에서 끌어다 쓴 막대한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발생해도 높은 금리 탓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보유한 유전 자산의 가치를 깎아내려야 하는 ‘손상차손’ 리스크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오히려 유가 하락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내내 원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유가가 더 내려갈 공간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환율과 세금, 그리고 금융 비용이라는 세 겹의 장벽이 버티고 있는 한 소비자들의 체감 기름값과 기업의 실적 개선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유가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의 구조적인 모순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잇(IT)야기] 삼성전자가 국가대표 ‘수면 개선’에 나선 까닭](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083875_176x135.jpg)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