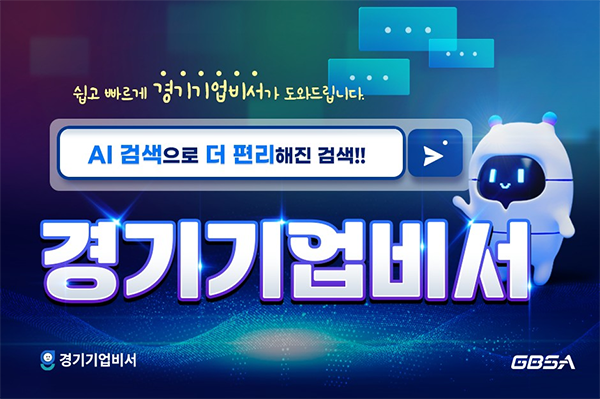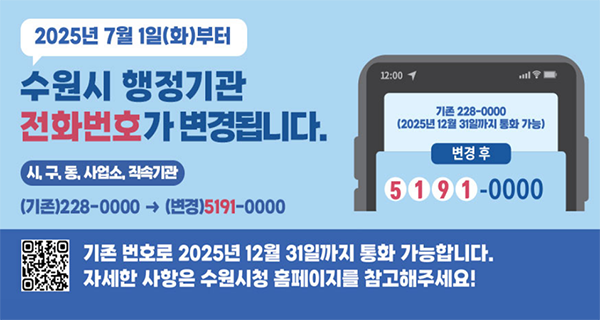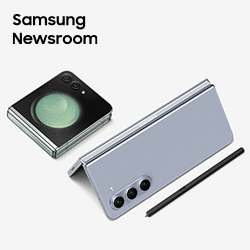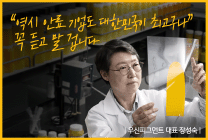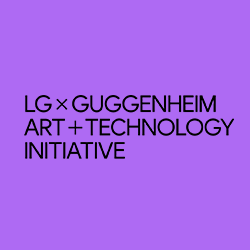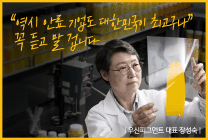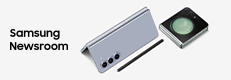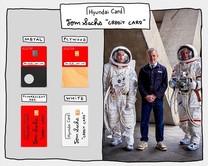시장 골목길을 다녀보면 흔히 당귀를 볼 수 있다. 신문이나 홈쇼핑방송에는 당귀가 마치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처럼 소개되기도 한다.
‘과연 당귀는 아무나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가?’ ‘혹 잘못 썼을 때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신문이나 홈쇼핑방송광고에서는 마치 당귀가 한의학적인 수치법제와 복용하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말린 것을 그대로 달여 복용하거나, 그 상태로 갈아서 날 것으로 복용해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에서는 당귀를 그저 흔한 풀뿌리나 민간요법에 쓰는 약초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당귀
동의보감 원문에 “초부-97. 당귀(當歸, 승검초 뿌리) 당귀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매우며, 독이 없다(性溫․味甘․辛․無毒). 모든 풍병, 혈병, 몸이 허약하고 피로한 것을 치료하고, 궂은피를 헤치며, 새피를 만들고, 징벽과 부인의 붕루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린다. 여러가지 나쁜 창양과 쇠붙이에 다친 것과 각혈이 속에 뭉친 것을 치료하고, 이질로 배가 아픈 것을 멎게 하며, 온학을 치료한다. 오장을 도와주며, 살을 나게 한다(治一切風, 一切血, 一切勞, 破惡血, 養新血, 及主癥癖, 婦人崩漏․絶子, 療諸惡瘡․瘍, 金瘡․客血內塞, 止痢疾․腹痛, 治溫瘧, 補五藏․生肌肉).'
'산과 들에서 자라는데 심기도 한다. 음력 2월과 8월에 뿌리를 채취해 그늘에 말린다. 살이 많고 마르지 않은 것(상품)이 효과가 좋다. “살이 많고 눅눅하면서 빳빳하게 마르지 않은 것(상품)이 효과가 좋다”고 하기도 한다. 또 “말꼬리 같이 생긴 것(상품)이 효과가 좋다”고도 한다(生山․野或種蒔. 二月․八月採根陰乾, 以肉厚․而不枯者爲勝. 又云, 肥․潤․不枯․燥者爲佳. 又云, 如馬尾者․好).'
'어혈을 헤치려고 할 때는 머리쪽의 단단한 한 마디를 쓰고, 통증이나 출혈을 멎게 할 때는 잔뿌리를 쓴다(要破血, 卽使頭一節, 硬․實處, 要止痛․止血, 卽用尾).(본초)'
'머리를 쓰면 어혈을 헤치게 하고, 잔뿌리를 쓰면 출혈을 멎게 한다. 만일 전체를 쓰면 한편으로는 피를 헤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출혈을 멎게 하므로, 피를 조화시키는 것이 된다. 수소음경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심이 피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족태음경으로도 들어간다. 그것은 비가 피를 싸고 있기 때문이다. 족궐음경으로도 들어간다. 그것은 간이 피를 저장하기 때문이다(用頭則․破血, 用尾則․止血, 若全用則一破․一止, 卽和血也, 入手少陰, 以心主血也, 入足太陰, 以脾裹血也, 入足厥陰, 以肝藏血也).(탕액)'
'기운과 혈이 혼란됐을 때 복용하면 기운과 혈이 곧 안정되게 되고, 각각의 해당된 곳으로 보내는 것은 당귀의 효능이다. 몸 윗도리 병을 낫게 하려면 술(곡부−66)에 담갔다가 쓰고, 몸 겉의 병을 낫게 하려면 술로 씻어서 쓰며, 혈병에 쓸 때는 술에 축인 다음 쪄서 쓰며, 담이 있을 때는 생강(채부−01)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氣․血昏亂者, 服之卽定, 各有所當歸之功, ❶治上․酒浸, ❷治外․酒洗, ❸血病․酒蒸, ❹痰用․薑汁․炒).(입문)'
'술에 담가서 쓰는 것이 효과가 좋다(得酒浸過, 良).(동원)'고 기록돼 있다.
(주 : 1.위 본문은 역자의 '물고기 동의보감'에서 인용했다. 초부-97은 약으로 쓰이는 풀 267종 중에서 97번째 기록이라는 뜻이다. 수부-40.졸인 젖도 약으로 쓰이는 짐승 236종 중에서 40번째 기록이라는 뜻이다. 곡부−66. 술도 약으로 쓰이는 곡식 106종 중에서 66번째 기록이라는 뜻이다. 역자는 이같은 방법으로 1천403종의 탕액을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양승엽코드'라고 이름지었다.)
(주 : 2. 역자는 약재의 품질이 좋은 것이거나 진품인 것을 상품이란 용어로, 품질이 낮거나 가짜를 하품이란 용어로 '양승엽코드'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약재의 품질이 좋은 것이거나 진품약재를 찾고 싶으면 ‘상품’이란 검색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모든 탕액자료를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치법제도 하지 않고 함부로...
윗글에 있는 동의보감 내용을 요약하면 당귀의 머리 부분은 어혈을 헤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잔뿌리를 쓰면 출혈을 멎게 하는 작용이 있다. 만일 전체를 쓰면 한편으로는 피를 헤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출혈을 멎게 하므로, 피를 조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 방법으로 정리하면 쓰는 부위에 따라 대략 4가지 정도의 사용법이 있다.
약재의 효능을 높이거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약재를 가공하는 방법을 '수치법제'라고 한다. 몸 윗도리 병을 낫게 하려면 술(곡부−66)에 담갔다가 써야 하고, 몸 겉의 병을 낫게 하려면 술로 씻어서 써야 하며, 혈병에 쓸 때는 술에 축인 다음 쪄서 써야 하며, 진액이 열을 받아 변하여 생긴 담에는 생강(채부−01)즙에 축여 볶아서 써야 한다.
수치법제 방법에 따라 대략 4가지 정도의 사용법이 있다. 위의 부위별 사용방법과 수치법제 방법이 각각 4가지다. 따라서 당귀를 활용하는 방법은 16가지 이상된다. 또 동의보감 원문에서 봤듯이 당귀는 수치법제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쓰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수치법제해 용도에 따라 써야한다. 즉, 환자의 상태를 보고 꼭 술이나 생강과 함께 써야 효과를 보는 약제다.
◇수치법제는 한의사만 할 수 있다
당귀는 민간에 많이 알려진 약이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구하기도 쉽고 치료 효능이 뛰어나 한의학에서 없어서는 안될 약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길거리 한약재나, 일간지·홈쇼핑의 건강식품에 쓰이는 민간약초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 십전대보탕’을 살펴보면 당귀는 술에 축인 다음 쪄서 써야 한다.
그런데도 길거리나 홈쇼핑방송 등에서 수치법제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일반인에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을 과학화한다는 XX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만든 'XX녹용대보'에는 당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모 한의사가 나와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하는 건강식품인 'X황제공진원', 'X황제공진환', 'X황제공진단' 등의 제품이 소개될 때도 당귀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런 제품에는 어떤 방법으로 당귀를 쓰는지, 말린 당귀를 그냥 갈아서 쓰는지, 당귀의 어는 부위를 쓰는지도 궁금하다. 만일 위에서 열거한 16가지 방법 중에서 당귀를 수치법제해 쓴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당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한의사의 정식처방에 들어가는 약제가 된다. 즉, 한의사의 처방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권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이런 문제를 한의학계에서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일부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동의보감과 투명인간’ 처럼 비과학적이라고 트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하루빨리 나서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길거리 십전대보탕’이나 건강식품에 자주 등장하는 약제인 ‘천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프로필>
1987년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1회 졸업
1987년-현재 대구 인제한의원 원장
2011년 ‘물고기 동의보감’ 출간
대표전화 053)555-5508
www.injec.co.kr























![[우상결] 기사회생 노리는 홈플러스, 새 주인 맞기 ‘초읽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7/art_1751522012_176x135.jpg)

![[쿨韓정치] 안철수가 쏘아올린 공…벼랑 끝 '野 혁신위'](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1938917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