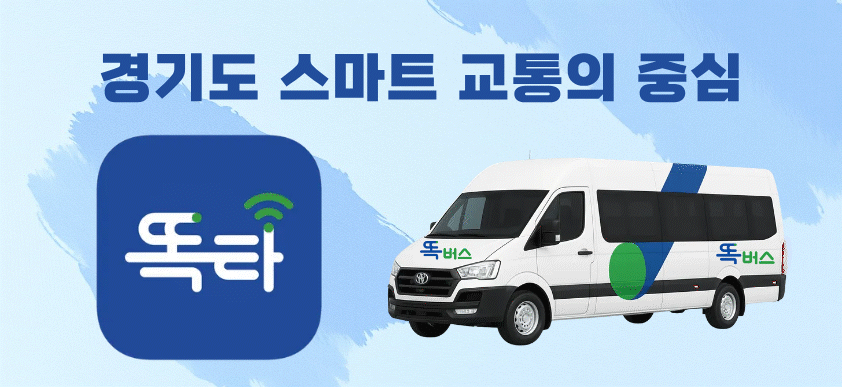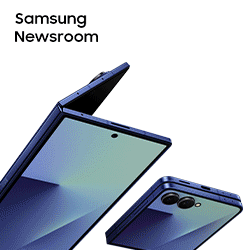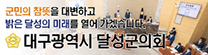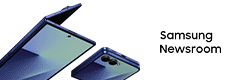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Han Q'. '통신 3사 새끼들아. 요금 좀 내려봐라'.2013.
윤 작가가 예명을 여러개 사용하는 것은 추사 김정희가 평생에 걸쳐 334개의 명호를 사용한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라고 한다. 이렇듯 그의 작품은 전시가 개막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전시 개막 후에는 퍼포먼스가 이어지는데 이 또한 미리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상상의 여지를 마련한다.
윤 작가는 "어떤 관객이 이 작품을 보았는데 얼마 뒤에 다른 관객은 다른 작품을 보았다면 어떤 상황을 불러올 것인가"가 자신의 관심사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존의 전시 문법의 '관례'와 '틀'을 바꿔보자는데 있는 전시는 한번 설치되면 작품이 철수될 때까지 고착돼 있는 전시를 '죽은 전시'로 규정하고, 전시가 장례식이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인공호흡을 하거나 정신을 차리게 따귀를 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전시 오프닝 날 전시장에는 폐품으로 만든 오브제들이 몇 점 놓이거나 걸리게 될 것이라는 귀뜸을 한 작가는 '운칠기삼-인생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오브제를 통해 인생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보는 사람들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임을 펼쳐낼 예정이다.
'사물은 초즈의 치즈를 선택했다'라는 이번 전시의 제목은 작가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떠오른 세 개의 똑같은 단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이 문장을 올렸을 때 작가의 페이스북 친구인 프랑스인 알랭 파페로네는 불어로 번역할 경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말을 듣고 작가는 "그렇지! 세상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 않아?"라며 문제가 없으니 해답도 없음을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기후동행카드 탑재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99160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