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등 공동연구팀, '그래핀으로 밴드갭 형성' 전류 제어기술 개발
차세대 전자소자 활용 가능성 '활짝'…관련 연구 논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7월호 소개
 최원석기자 |
2016.08.03 15:50:58
최원석기자 |
2016.08.03 15:5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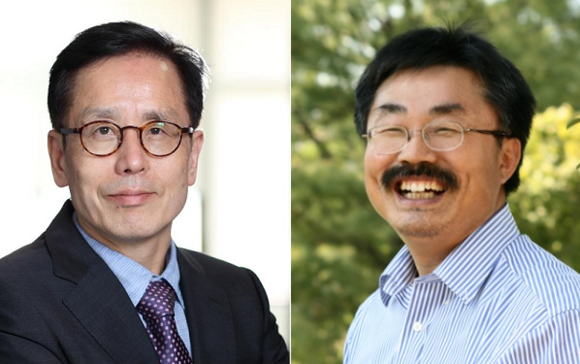
▲부산대 정세영 교수(왼쪽 사진)와 성균관대 이영희 교수. (사진제공=부산대)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등 공동연구팀이 세계 처음으로 수인치(inch) 이상의 크기를 가진 단일결정의 '그래핀(Graphene)' 두 장을 겹쳐 밴드갭을 형성함으로써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돼 그래핀의 전자소자 활용 가능성을 대폭 넓히게 됐다.
부산대는 나노과학기술대학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세영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 성균관대 이영희 교수 등 공동연구팀이 단일결정의 그래핀 두 장을 겹친 밴드갭 형성을 통한 전류 제어 기술 개발에 최근 성공해, 신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지(IF=18.96) 7월호 온라인판에 '웨이퍼 스케일의 단결정 AB 누적 이중층 그래핀(Wafer-Scale Single-Crystalline AB-Stacked Bilayer Graphene)'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원자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로, 흔히 연필심 등에 사용되는 흑연의 한 층이다.
두께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될 만큼 매우 얇고 투명하며, 상온에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지 않아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 산업의 발달로 휘거나 구부러지는 등 다양한 물리적·기능적 특성을 지닌 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면서 그래핀의 물성은 차세대 전자소자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래핀은 밴드갭이 없어 전류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산업적 응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핀은 활용을 위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 흑연을 한 장씩 떼어 실험했을 정도로 크기가 수십 마이크론(밀리미터의 1/1000)으로 매우 작아 폭넓은 연구와 응용이 어려웠다. 크기가 작으면 그래핀 고유의 뛰어난 물성(物性)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크기의 그래핀이 필요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또 단결정일 때 전자이동도가 커지므로, '대면적(大面積)이면서도 단결정인 그래핀'은 전자소자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필수조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해 대면적 그래핀을 성장시켜 왔으나, 여전히 고품질의 단결정 그래핀은 크기가 수백 마이크론에만 머물렀고, 대량합성에서 재연성(reproducibility·재생산 가능성)이 떨어져 응용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나의 단일층 그래핀 성장을 위해서는 단결정 기판의 준비가 중요한데, 기판으로는 대면적 성장에 유리한 구리 기판을 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 번 사용 후 표면 평탄화 및 열처리 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단결정 그래핀을 재생산하는 일은 어려웠다.
특히, 그래핀은 어떤 물질보다 전기는 잘 통하지만 밴드갭이 없어 전류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위칭기능(온오프)이 필요한 전자기기의 소자로는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래핀 두 장을 겹치면 밴드갭이 생겨 전자소자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정세영 교수 연구실에서 실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박막(얇은 막) 성장 장치인 스퍼터링 장비를 사용해 구리 박막을 단결정 형태로 2인치와 4인치 기판 위에 각각 성장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공동연구팀은 일차적으로 스퍼터링으로 준비된 단결정 구리 박막 위에 그래핀을 단결정 형태로 2인치 사이즈로 성장시키고, 두 층의 단결정 그래핀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층간 각도를 정확히 조절해 전사시켜 AB 겹침 그래핀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백 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고속 스위칭 소자의 가능성을 조사했다.
'스위칭 소자'란 전자기기에서 온-오프 기능을 하는 소자로, 전기전도도가 높아 소자의 값이 정확해지면 온-오프 기능이 원활해진다.
또, 연구팀은 그래핀의 상업적 성장을 막았던 재연성 문제도 단결정 박막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대 정세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래핀을 대면적의 단결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학문적으로 많은 추가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그래핀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고 연구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신기술 융합형 성장 동력 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공동연구팀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 성균관대 이영희 교수와 루안(Luan) 박사, 부산대 정세영 교수와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박사후과정 중인 이승훈 박사 및 부산대 박호열 석사과정생 등이 참여했다.
정세영 교수 연구실에서는 기판 물질인 단결정 구리 박막을 만들고 이 박막의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이영희 교수 연구팀은 정세영 교수 연구실에서 성장한 고품질 단결정 구리 기판 위에 그래핀 단결정을 성장하고 전사해 AB 겹침 그래핀을 만들어 이에 대한 물성 측정과 소자 가능성을 확인했다.
(CNB=최원석 기자)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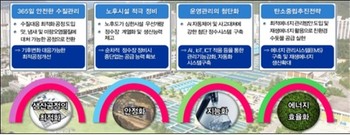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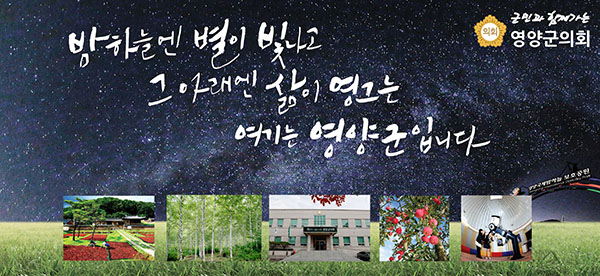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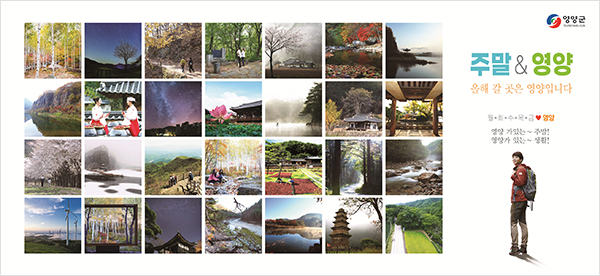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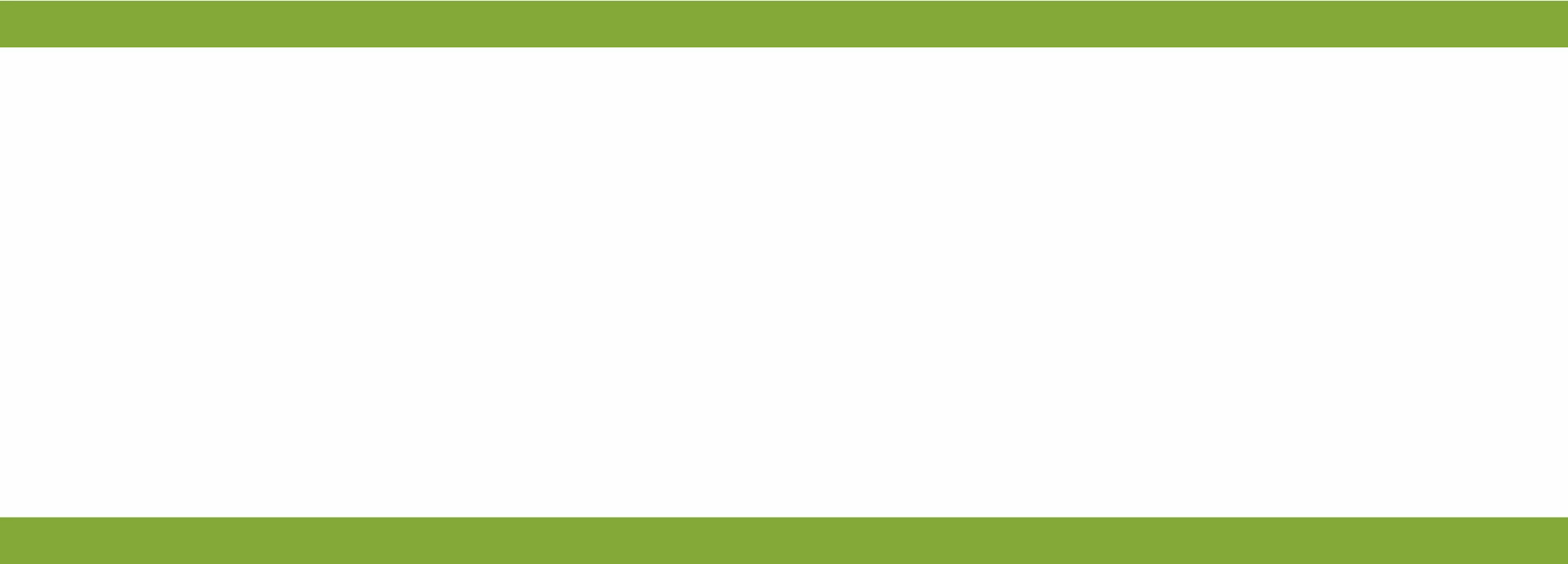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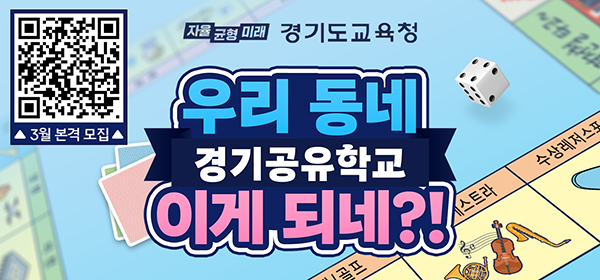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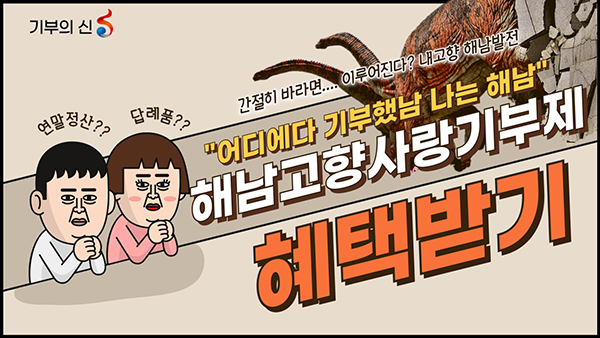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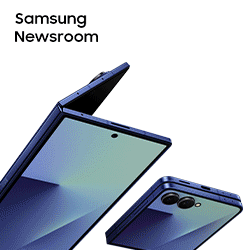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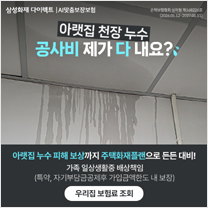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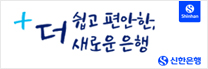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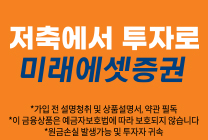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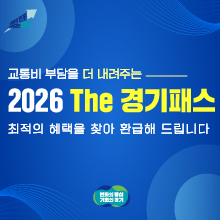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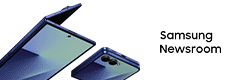
![[더불어금융⑤] ESG 실천하는 ‘작은기업’과 맞손…롯데카드의 특별한 ‘상생’](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257984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