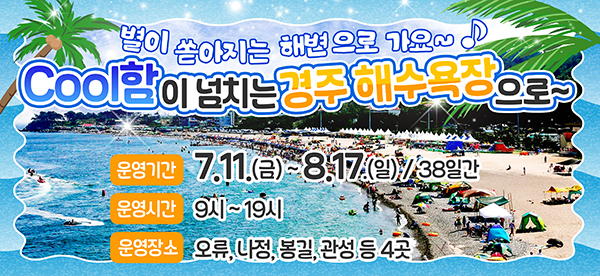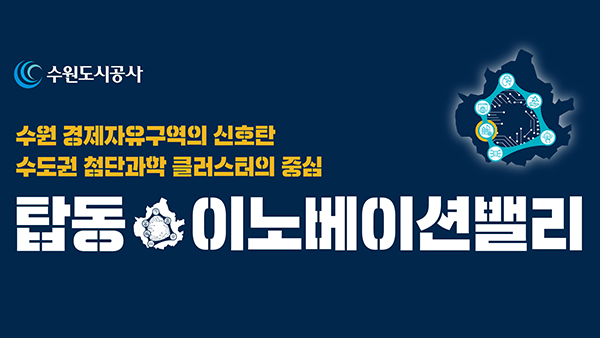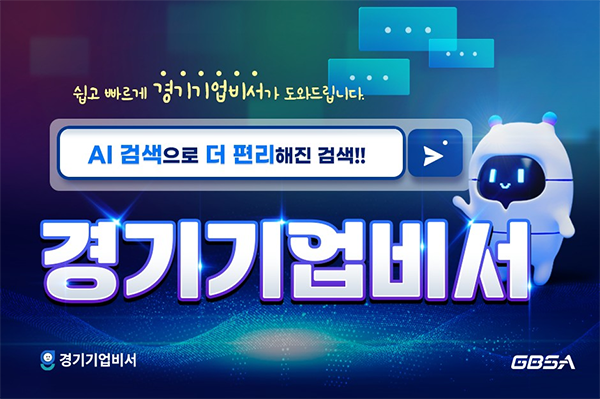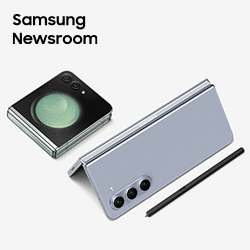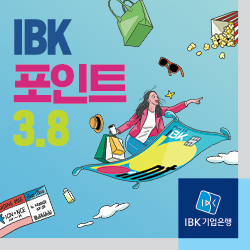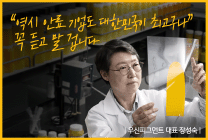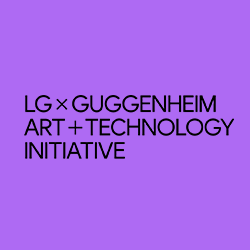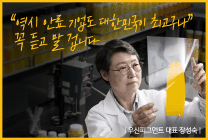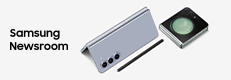한의학이 생긴 이래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세기에도 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굶주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굶주림이 있었을 때 즉, 식량이 귀하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먹었던 것이 복령이다.
또 복령은 한의학에서 질병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약제다. 복령은 과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 것일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어떤 복령이 품질과 효능이 우수한 것일까? 요즘 복령이 귀해지고 있다는데 복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동의보감에 기록된 복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동의보감에 나오는 복령과 복신
동의보감 원문에 '목부-24. 복령(茯苓, 소나무 뿌리 진이 모인 것)−소나무⑨−복령은 성질이 평순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性平․味甘․無毒). 입맛을 나게 하고 구역을 멎게 하며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킨다. 또 폐위로 담이 막힌 것을 다스리고 신에 있는 사기를 몰아내며 소변을 나가게 하고 수종과 임병으로 소변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 또한 소갈을 멎게 하고 건망을 치료한다(開胃, 止嘔逆, 善安․心神. 主肺痿痰壅, 伐腎邪․利小便, 下水腫․淋結, 止消渴, 療健忘).'
'선경에 음식 대신 먹으면 아주 좋다고 했는데 이르기를 "이 약은 정신을 통하게 해 영민하게 하고 혼을 조화시켜 백을 단련시키며 9규를 밝게 하고 살찌게 하며 장을 좋게 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또 영을 고르게 하고 위를 다스리는 상품(높은 품성약)에 속하는 선약이다. 따라서 능히 곡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한다"고 했다(仙經服食, 亦爲至要, 云其通神․而致靈, 和魂․而鍊魄, 明竅․而益肌, 厚腸․而開心, 調榮․而理胃, 上品․仙藥也, 善能斷穀不飢).'
'산속 곳곳에 있다. 송진(목부-06)이 땅에 들어가 천년 지나서 복령이 된다. 소나무 뿌리를 싸고 있으면서 가볍고 퍼석퍼석한 것은 복신(목부-25)이 된다. 음력 2월과 8월에 채취해 그늘에서 말린다. 크기가 3~4되(6~8kg)가 되고 겉껍질에는 검고 가는 주름이 있으며 속은 굳으면서 흰데 생김새가 새, 짐승, 거북, 자라 같이 생긴 것(상품)이 효과가 좋다(生山中, 處․處有之, 松脂入地千歲, 爲茯苓, 其抱根․而輕․虛者爲茯神, 二月․八月採, 皆陰乾, 大如三․四升器, 外皮․黑․細皺, 內堅․白, 形如鳥․獸․龜․鱉者, 良).(본초)'
'흰 것과 붉은 것 두 종류가 있다. ①흰 것은 수태음경·족태양경·족소양경으로 들어가고, ②붉은 것은 족태음경·수태양경·수소음경으로 들어간다. 또 "①흰 것은 신으로 들어가고 ②붉은 것은 심으로 들어간다"고도 한다(有白․赤二種, ①白者․入手太陰經·足太陽經·足少陽經, ②赤者․入足太陰經·手太陽經·少陰經. 又云①色白者入壬癸, ②色赤者入丙丁).(탕액)'
'①흰 것은 기운을 도와주고 ②붉은 것은 기운을 내리게 한다(①白色者․補, ②赤色者․瀉).(본초)'
'쓸 때는 겉껍질을 벗겨 제거한 다음 갈아서 수비해 물위에 뜨는 붉은 막을 제거하고 볕에 말린다. 이렇게 해야 눈이 상하지 않는다. 음이 부족한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한다(凡用, 去皮爲末, 水飛, 浮․去․赤膜, 晒乾用, 免致損目, 陰虛人勿用).(입문)'고 기록돼 있다.
동의보감 원문에 '목부-25. 복신(茯神, 소나무 뿌리 진이 모인 것)−소나무⑩−복신은 성질이 평순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性平․味甘․無毒). 풍현과 풍허를 다스리고 경계를 멎게 하며 건망을 치료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며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 또 혼과 백을 편안하게 하고 정과 신을 길러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의지를 안정시키며 경간을 다스린다(療風眩․風虛, 止驚悸, 治健忘, 開心益智, 安魂․魄, 養精․神, 安神․定志, 主驚癎).'
'복령(목부-24)은 벌목한지 여러 해된 소나무 뿌리의 기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대체로 그 기운과 맛이 오로지 몰려 있어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체가 만들어진다. 그 진액과 기운이 왕성해 뿌리 밖으로 새나가 뭉쳐진 것은 복령이 된다. 비록 진액과 기운이 있기는 해도 아주 왕성하지 못하고 다만 나무뿌리에 맺혀 잠복돼 멈춰있는 것을 복신이라 한다(茯苓, 乃採斫訖, 多年松根之氣所生, 盖其氣․味, 壹鬱未絶, 故爲是物, 其津․氣盛者, 方發泄於外, 結爲茯苓, 雖有津․氣․而不甚盛, 止能結伏於本根, 故曰茯神).(본초)'
'소나무는 베면 다시 싹은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 뿌리는 죽지 않고 진액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어 복령(목부-24)과 복신이 생긴다. 이들을 써서 심과 신을 치료하고 진액을 통하게 한다(松木, 斫不再抽芽, 其根不死, 津液下流, 故生茯苓·茯神, 因用․治心․神, 通津液).(입문)'고 기록돼 있다.
(주 : 1. 위 본문은 역자의 '물고기 동의보감'에서 인용했다. 목부-06, 24, 25는 약으로 쓰이는 나무 158종 중에서 6, 24, 25번째 기록이라는 뜻이다. 역자는 이같은 방법으로 1천403종의 탕액에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양승엽코드'라고 이름지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약제에 관한 전체자료를 찾고 싶으면 ‘−소나무’란 검색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탕액자료(15종)를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 : 2. 역자는 약재의 품질이 좋은 것이거나 진품인 것을 '상품'이란 용어로, 품질이 낮거나 가짜를 '하품'이란 용어로 '양승엽코드'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약재의 품질이 좋은 것이거나 진품약재를 찾고 싶으면 ‘상품’이란 검색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모든 탕액자료를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 : 3. 일반적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어렵다’는 뜻이다. 복령의 세번째 조문의 ‘송진이 땅에 들어가 천년 지나서 복령이 된다’는 내용도 송진이 복령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앞글에서 녹각의 두번째 조문의 경우도 ‘사슴은 천년 동안 살면서 오백년간 털이 희어진다고 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사슴이 ‘오래 사는 짐승’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탕액(약제)으로도 쓰이고 십장생에도 사슴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작은 내용을 가지고 '동의보감과 투명인간’ 처럼 시비걸지 않기를 바란다)
◇백복령과 적복령은 녹용과 녹각처럼 성질과 작용이 정반대
동의보감 원문에 따르면 복령을 생산하는 방법은 산에 간벌할 소나무를 고른 다음 나무를 벤다. 그러면 베어진 소나무의 뿌리 부분은 영양분을 계속 빨아 당기지만 땅위에 노출된 소나무는 베어졌기 때문에 영양분, 즉 송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영양분이 뿌리에 엉겨 만들어진 것으로, 그 뿌리마저도 전부 약으로 변한 것이다.
복신은 복령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한 영양분이 뿌리에 엉겨 만들어진 것인데, 뿌리 부분은 약으로 변하지 않아 채취하면 겉모양은 복령과 비슷하지만 뿌리는 심의 형태로 속에 남아있다. 이런 차이로 복령과 복신을 구별한다.
복령은 색깔에 따라 흰 것과 붉은 것 두가지 종류가 있다. 흰 것을 백복령이라 하는데 기운이 모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다. 붉은 것은 적복령이라 하는데 백복령과는 반대로 몰린 기운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복령 한가지에서 성질과 작용이 정반대인 백복령과 적복령의 두가지 약제가 나오게 된다.
복령은 몸의 하부에 작용하는 약이다. 요즘의 서양의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장계통에 작용하는 약이다. 복신은 몸의 상부에 작용하는 약이다. 요즘의 서양의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는 약이다.
그래서 의학입문에 복신과 복령으로 ‘심과 신을 치료하고 진액을 통하게 한다’고 했다. 복령과 복신은 음력 2월과 8월에 채취해 그늘에서 말린다. 크기가 3~4되(6~8kg)가 되면서 새, 짐승, 거북, 자라 같이 생긴 것이 품질과 효능이 좋은 것, 즉 '상품'이다.
소나무의 진이 뿌리에 모여 복령이 된다해도 100퍼센트 복령화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속에는 불순물이 있게 된다. 복령은 물에 갈아서 휘저어도 약의 성분이 빠져나오지 않는 불용성 약제다. 그래서 수치법제하는 방법을 '의학입문'에서 '쓸 때는 겉껍질을 벗겨 제거한 다음 갈아서 수비해 물위에 뜨는 붉은 막을 제거하고 볕에 말려서 쓴다. 이렇게 해야 눈이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을 때 도토리를 갈아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복령은 껍질과 막을 제거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 '동의보감 탕액서례문(湯液․序․例門)'−약을 법제하는 방법(修․製法) 조문에도 "복령은 갈아서 물에 담가 휘저은 다음 뜨는 것은 제거하고 써야 한다. 뜨는 것은 복령의 힘줄로 사람의 눈을 몹시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茯苓爲末, 於水中攪, 浮者去之, 是茯苓筋, 最損人目).(본초)"고 분명한 수치법제 방법을 한번 더 강조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의 성질을 보존하면서도 복령 속에 들어있는 복령의 힘줄을 제거하고 눈이 상하는 부작용을 막는 수치법제는 반드시 '동의보감'이나 '의학입문', '본초강목' 원전에 따라야 한다.
◇간벌로 일석백조 효과, 인공재배 가능한 약제 ‘복령'과 '복신’
선경에 ‘복령을 음식 대신 먹으면 아주 좋다’고 했다. 또 복령은 사람의 몸을 도와주는 약으로 부작용이 없어서 늘 먹을 수 있는 높은 품성약에 속하는 '선약'이라 했다. 그러나 복령도 수기를 빼는 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음이 부족한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식량이 귀하던 시절 복령을 수치법제해 떡을 만들어 구황식품으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했다는 말인데 요즘은 왜 이렇게 귀해졌을까?
그 이유는 요즘도 복령을 생산하는 방법을 몰라 심마니들의 탐침 즉, 쇠막대기를 땅에 찔러서 복령을 찾는 방법에 의한 수작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폭우와 산에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해져 산사태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반드시 산림을 재정비해야 한다. 산림재정비를 위한 간벌 때 소나무도 동의보감식으로 간벌하면 복령과 복신을 생산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풀로 된 267종의 약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들도 같이 복원할 수 있어 일석백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동의보감 복령과 복신’을 살펴봤다. ‘동의보감 십전대보탕’에는 ‘동의보감식으로 수치법제한 백복령’을 써야 한다. 한의학을 과학화한다는 XX제약 식품사업부는 신문이나 홈쇼핑방송을 통해 ‘XX녹용대보’란 이름으로 원전을 마구잡이로 인용한다. 그들이 광고하는 건강식품에 백복령을 쓴다는데 과연 어떤 백복령을 쓰는지 궁금하다.
한의협이나 유관단체에서는 유네스코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2013년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내후년에 기념식이나 축하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역자는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지금 ‘동의보감 복령과 복신’을 재연해서 환자에게 처방하려면 역자가 그래왔던 것처럼 한의사가 직접 복령과 복신을 구한 다음 위의 방법대로 만들어 원시인처럼 자급자족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 숙지황'에서부터 '동의보감 복령'에 이르기까지 '동의보감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제 12종을 살펴봤다. 동의보감이 어떤 책인가. 한의사에게는 경전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동의보감 원전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내용이 있다’며 억지 트집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등재를 배아파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한의학이 비과학적이고 엉터리'라고 공격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글에는 ‘십전대보탕’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프로필>
1987년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1회 졸업
1987년~현재 대구 인제한의원 원장
2011년 '물고기 동의보감’ 출간
대표전화 053)555-5508
www.injec.co.kr
blog.naver.com/fish201























![[테크크] ‘자국 인공지능’ 발판 놓는 SK텔레콤·KT](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9/art_1752469869_176x135.jpg)
![[연중기획-기업과나눔(164)] 우리은행, 미래세대 꿈을 응원하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9/art_1752470158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