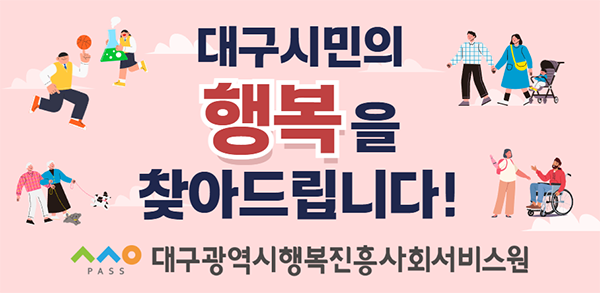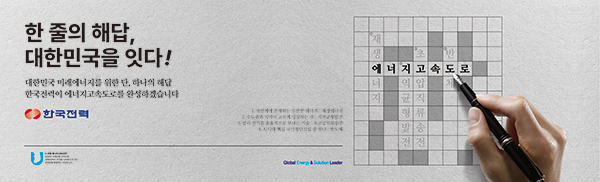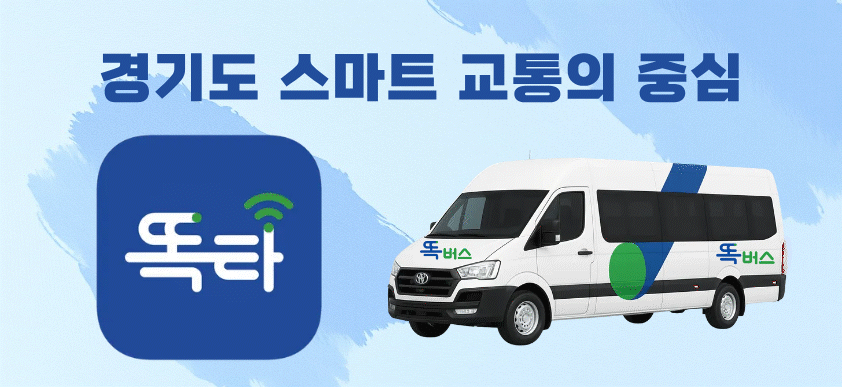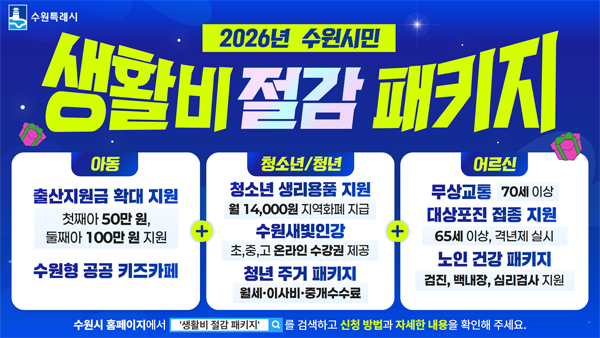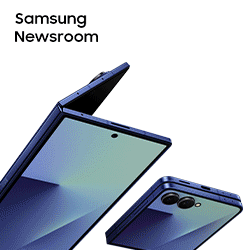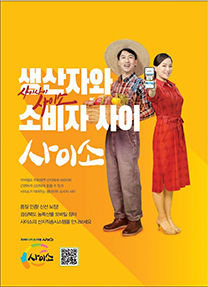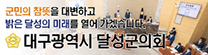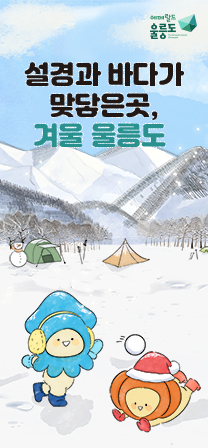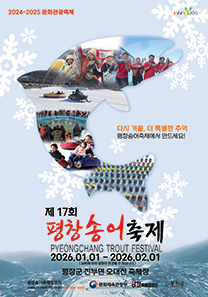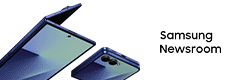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 딱히 누군가 불러준 적이 없었음에도 약 10년간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이름 앞에 붙이고 있었다. 항상 생계와 자기만족 사이에서 고민하며 지내는 기간 동안 가장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질문 하나는 한 친구의 ‘예술가는 아니, 너는, 왜 “독도는 우리 땅”같은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하지 않는가? 너는 고귀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작품만 하나?’라는 불만 섞인 소리였다.
당시엔, ‘어떤 예술가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작품 안에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예술가는 자신만의 철학을 자신이 발견한 예술 표현의 방법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사회적 메시지를 작품 안에 담지 않는 것이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는 자의적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허공에 떠돌다 없어지는 메아리와 같다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기자가 되고나니 골방에 틀어박혀 작업만 할 때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던 사회 현상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굳이 끼워 맞추자면, 예술가와 기자의 공통점은 사회가 무시하고 있던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기자도 예술가도 사회 현상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거리를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어떤 기자는 소식을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에 만족하고, 어떤 기자는 부조리한 상황을 널리 알리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스스로의 갈등은 그 ‘거리’에서 발생한다. 발화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이슈는 크게 부각될 수도 작게 묻힐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미술계에는 이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다. 하나는 그룹 ‘뮌’의 ‘아트 솔라리스’라는 작업이다.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가면 예술가 및 기획자 등의 미술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들이 별자리처럼 서로 연결돼있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열렸던 전시를 바탕으로 조사된 빅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현재 뿐만 아니라 시대별 인맥도 까지 살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856명의 사람들과 809개의 전시만을 보여주는 미술계 일부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한데 모여 바글거리는 이름들과 개인의 출신학교까지 노출되는 것은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프로젝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권력’에 관한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됐던 또 다른 작업은 이완작가가 최근 ‘Lady Dior As Seen By Seoul(레이디 디올 에즈 씬 바이 서울)’전에 선보인 ‘한국 여자’시리즈 중 한 작품이었다. 여대생인 듯 앳돼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검정 드레스와 빨간색 명품 백을 들고 어느 거리에 서 있는 이미지의 사진 작품이었다. 작가는 “경쟁압박과 생존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여성을 사회적 계급의 상징이 된 디올백과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한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배경이 되는 거리였다. 각종 간판들이 난잡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였는데, 작가는 일반적인 번화가 거리라고 했지만, 비판적인 시각들은 간판 안에 있는 글씨들이 유흥거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유흥과 함께 명품을 소비하는 한국 여성(스스로 명품을 마련할 수 없는 어린나이의 여성의 이미지가 저변에 깔린)의 이미지로 읽힌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이 논란은 작품이 전시회에서 강제 철수까지 되게 했고, 작가는 유감을 표명하는 소동이 됐다.
이 두 작업은 사진, 인터넷, 영상 등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작업이다. 그 결과는 매체들의 속성만큼 즉각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속성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젊은 작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매우 용기를 내야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왜 문화면이 아닌 사회면에서 먼저 이슈가 되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들 두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점은 미술이 고전적으로 사용해왔던 상징성보다 언어들이 먼저 읽힌다는 것이다. 뮌의 작업에서는 실명이 사용됐고, 이완의 사진작업에서는 ‘룸소주방’이라는 간판의 단어가 보인다.
그들의 작업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만일 대중의 작품에 대한 곡해가 생겼더라면, 그런 직접적인 단어의 사용이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어떤 훌륭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실명과 ‘룸소주방’이라는 단어였을 것이다.(룸 소주방이라는 곳은 노래방처럼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곳이란다. 그곳이 퇴폐업소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다)
현대 미술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열어놓는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특정한 정의 없이 어떤 현안에 대한 생각의 시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는 그들은 꽤 훌륭한 이슈메이커가 된 듯싶다. 하지만, 오히려 걸러지지 않은 언어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날 것 그대로의 던짐’도 뇌리에 강렬하게 남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은유를 통한 진중한 울림이 더 오래 남기도 한다. 핵심을 벗어난 논란으로부터의 해결책일 수도 있다. ‘정제된 미술언어’는 그래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 사회에게 약간은 점잔빼는 시적 언어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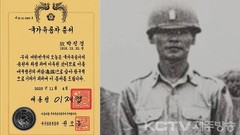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기후동행카드 탑재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99160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