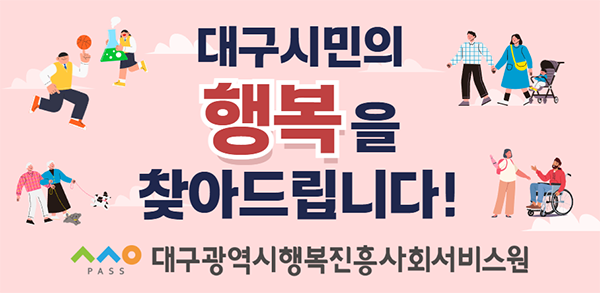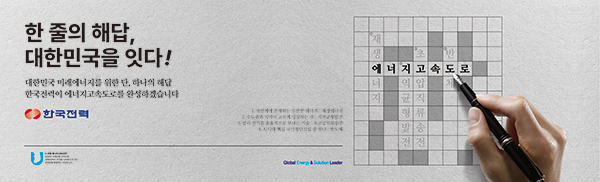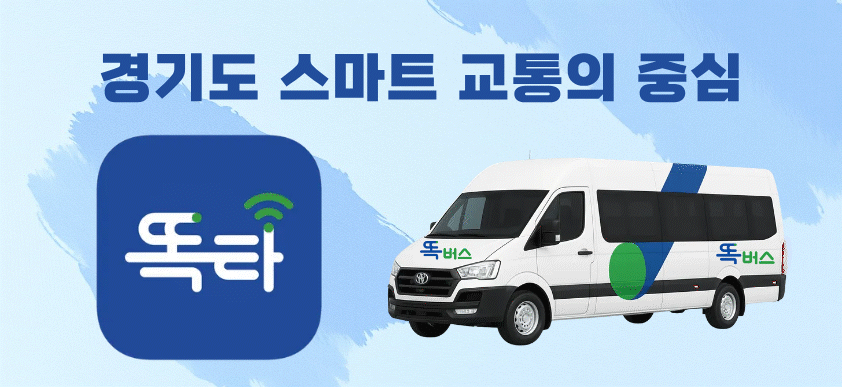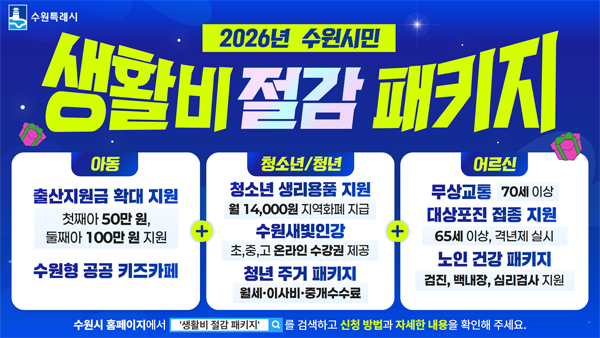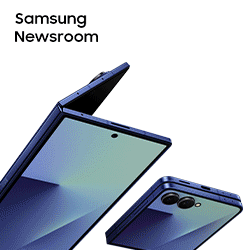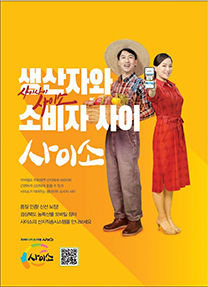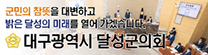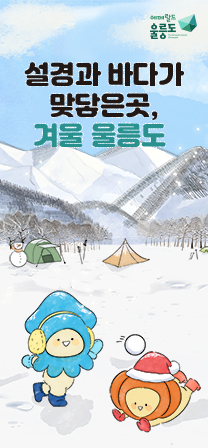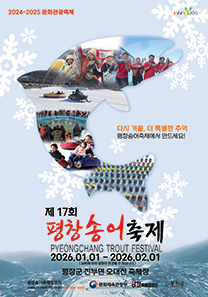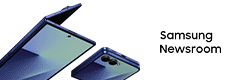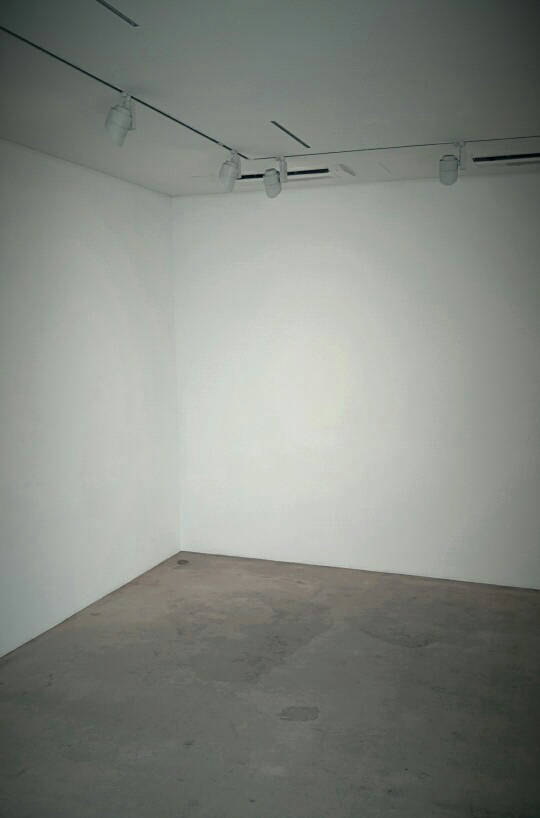
▲'화이트 큐브'라 불리는 갤러리, 미술관의 전시 공간.(사진=김연수)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대략 짚고 가자면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미술관이고, 다른 하나는 갤러리(화랑)이다. 미술관은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다. 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 전시는 유료고, 상설 전시는 대부분 무료다. 그리고 갤러리와 2000년대 이후 생긴 새로운 형태의 예술 공간들(대안공간, 복합문화공간, 신생공간, 아티스트런스페이스 등 여러 이름의) 역시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굳이 구태의연한 생활 정보를 들먹이는 이유는 지난 주말에 목격한 풍경과 든 생각들 때문이다.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기자는 주말에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일이 드물다. 그래도 가끔씩 취재 일정으로 주말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지난 주말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령되는 폭염 특보 덕에 두려움에 떨며 한낮의 더위에 뛰어들었다. 한 상업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에 관한 취재 일정이었다. 살인적인 날씨 때문이었는지 갤러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옆 갤러리서 열리는 이름 꽤나 알려진 작가의 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그곳에서 멀지 않은 미술관에는 인파로 가득했다. 갤러리도 미술관 못지않게 시원하고, 전문 큐레이터가 역량을 발휘해 작가와 함께 작품의 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전시를 꾸려내곤 하는데 왜 이런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질까.
혹시 상업 갤러리에 대한 편견 때문일까. 기자도 그랬다. 자세히 알기 전에는 상업 갤러리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는 ‘작품 판매 수익 수수료가 몇%라더라’, ‘어디 페어에 참여하는 데 돈을 얼마를 요구했다’ 등 소문에 가까운, 그것도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더불어 새하얀 공간이 가지는 위압감과 함께 혼자서 방어적인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같다.
한 상업 갤러리의 큐레이터는 “갤러리 안에 있다가 유리창 너머로 보는 아이들이나, 근처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 재미있는 전시 있으니 보고 가시라 권유하곤 하지만, 쉽게 발을 들여놓지 않으신다. 아직도 갤러리에서의 미술 작품 감상이 경제 상태가 좋은 사람들의 전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갤러리를 방문했다.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확실한 개성을 볼 줄 아는 관장의 안목이 맘에 들어 좋아하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컬렉터를 만났다. 미술 컬렉터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억 대의 작품을 사도 컬렉터고, 10~20만 원짜리 작품만 골라 사더라도 컬렉터다. 컬렉터는 ‘좋은 작품이 있어 사고 싶은데 집과 사무실에 도저히 놓을 자리가 없다’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면 컬렉터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 일부를 경매에 내 놓으면 되지 않나요? 갤러리가 위탁 경매를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라고 물으니, 관장은 “위탁 경매는 대형 갤러리들이 주로 한다”고 말한다. 미술의 시장 유통 구조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거기서 거기인지는 알 것 같았다.
정리하자면, 이날의 취재 일정 중 든 생각은 두 가지였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이려는 상업 갤러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을 예전보다 편하게 여기기 시작한 관객들이 아직은 미술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좀 더 많은 컬렉터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작품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갤러리의 역할이다.
상업 갤러리가 활성화되고, 컬렉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작가의 수준뿐 아니라 관객의 의식과 안목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작가가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사족으로, 주위에 가끔씩 현대 미술의 맹점(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이용해 그럴듯하고 예쁜 작품을 만들어 판매를 잘하는 작가들이 있다. 그런 경우 그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갤러리의 안목도 의심스러운 법이다. 그런 사람과 갤러리의 숫자도 꽤 된다. 그렇기에 만일 컬렉터가 되고 싶다면, 많이 공부하고 보는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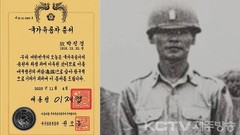
![[구병두의 세상읽기]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5769474_176x135.jpg)
![[내예기] ‘K-워터’ AI로 관리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도전과 혁신](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16194_176x135.jpg)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기후동행카드 탑재 外](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1765499160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