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까지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4년이 지난 현재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자살 사망자와 산재 사망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으로 5년 동안 28.2%나 감소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사상 첫 2000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자살 사망자는 2016년 1만3092명에서 2017년 1만246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8년 1만3670명으로 다시 올랐고 2019년 1만3799명, 2020년 1만3195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9월말 기준) 사망자는 9689명이다.
산재 사망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으로 감소세를 띠고 있긴 하지만 두드러진 흐름은 아니다. 2021년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지만, 목표로 했던 700명대 초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OECD 36개 회원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27위다. 하지만, 자살률과 산재사망률은 수년째 ‘OECD 1위’의 오명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지난 수년간의 시민 안전의식 향상, 주요 도로의 안전망 강화, 차량의 안전성 강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자살률과 산재사망률은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내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줄어들 날이 요원해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발휘할까?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할 경우,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
이 법은 사업장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한층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주요 건설사‧대기업 CEO들이 신년사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등의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의 오명을 감수할 수 없다며 진행 중인 건설현장 및 공장 운영을 잠시 중지했을 정도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이 붕괴·매몰되면서 노동자 2인이 사망하고, 1인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법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많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재사망자의 80.7%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며 공사금액이 계속 깍여나가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대형사고가 계속 터질 수 밖에 없다”며 “민간공사현장도 공공공사처럼 최저가낙찰 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를 채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정의식 기자)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176x135.jpg)

![[유통통] 유통가 장악한 ‘이것’…‘두쫀쿠 열풍’의 명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48841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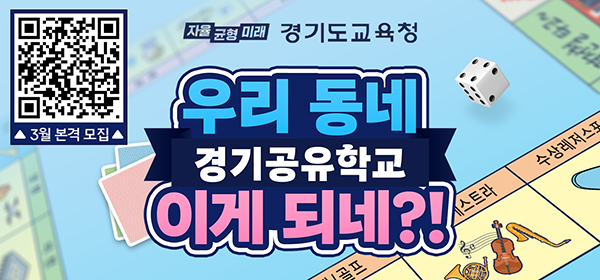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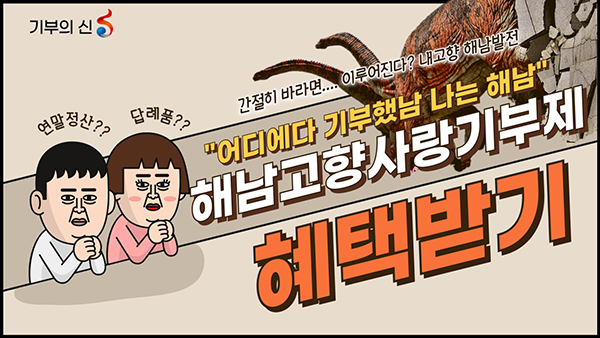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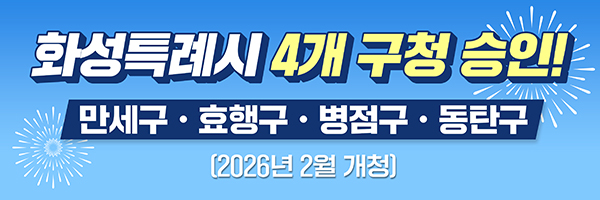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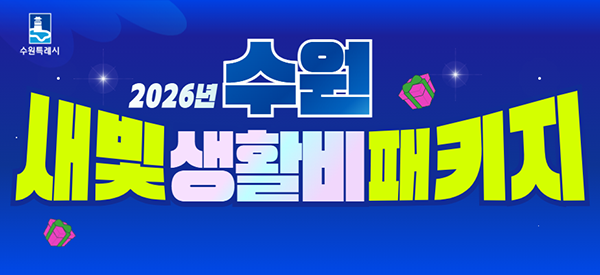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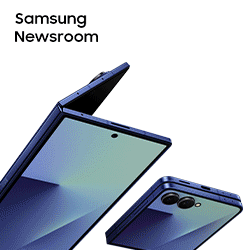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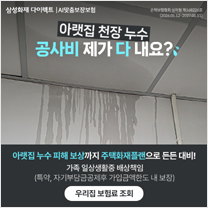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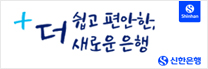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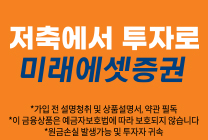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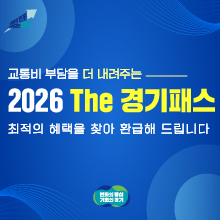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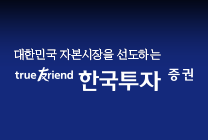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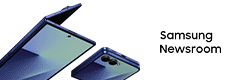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