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6년, 일본의 근대화를 연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 그 이름은 '샷초동맹(薩長同盟)'. 당시 일본의 유력 번(藩)이었던 사쓰마(薩摩)와 조슈(長州)가 손을 맞잡은 이 동맹은 도쿠가와 막부라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기폭제가 됐다. 사적 이해와 정치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쓰마와 조슈는 일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동의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들의 연대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었다. 과감한 자기혁신과 체제 해체를 동반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결단이었다.
158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대학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해체 수준의 수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최근 정부는 “지역대학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구조적 개혁과 집중 투자를 예고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기력하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외 지역대학의 상당수는 존폐 기로에 섰고, 몇몇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이제는 본질을 묻고, 대답할 시간이다. 샷초동맹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유신(維新)을 준비하고 있는가?
샷초동맹의 핵심은 '비상한 위기 앞에 비상한 연대를 선택했다'는 데 있다. 사쓰마와 조슈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념적 차이도 컸다. 그러나 ‘도쿠가와 체제’라는 공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양자는 분열보다 연합을 택했다. 오늘날 우리 지역대학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다. 지역대학 간의 연합이나 협업은커녕, 오히려 정원 경쟁, 지원금 경쟁, 지역 인재 쟁탈전으로 서로를 깎아내리고 있다. 지역 내 대학들조차 함께 미래를 그리는 대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역대학을 살릴 외부적 전략은 분명 존재한다.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확대, 지역대학 출신 의무채용제 도입, 국가 차원의 예산 집중투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샷초동맹이 단순히 정치적 타협이 아니었듯, 외부의 물적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자발적 변화, 혁신의 의지다. 조슈번은 유신 이전 이미 '하구 번정 개혁'을 통해 낡은 사무라이 체제를 혁파하고, 신분제를 완화하며 서양의 군사 및 교육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했다. 사쓰마 또한 서양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군제개편을 단행하며,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길러냈다. 그 결과 두 번은,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지역 소국'에 불과했지만, 일본 전체를 바꿀 중심축이 됐다.
우리의 지역대학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부 혁신은 더디고,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도 부족하다. 강의는 수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교원 인사는 연구 실적 위주로 왜곡된 시스템에 묶여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질적 교육은 드물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거의 없다. 학생들은 지역대학에 들어왔다가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할 방법만 찾는다. 이런 구조 속에선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다.
해법은 결국 혁신이다. 내부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자기혁신 말이다. 교원 시스템을 새로 짜고, 수업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동시에 각 대학은 서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하고, 샷초동맹식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내 대학이 뭉쳐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강의와 인력을 교류하며,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변화의 축을 분산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변화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대학에 대해선 서울대 수준의 전폭적 투자를 해야 한다. 반대로, 변화 없이 낡은 구조만 유지하려는 대학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모델은 '혁신+연합+선택과 집중'이라는 세 축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 자체로 거대한 국가 전략이다. 단지 명문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재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출발은 오늘의 지역대학 위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는 것이다. 샷초동맹은 불가능해 보였던 연합을 통해 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의 근대화였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대학 간, 그리고 정부와 대학 간, 또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새로운 동맹. 정치가 아니라 실용을 위한, 타협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연합이다. 역사는 보여준다. 모든 구조적 변화는 한순간에 온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연합과 혁신'으로 시작됐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176x135.jpg)



![[생생르포] ‘열린 공장’을 체험하다…평택 ‘hy팩토리+’ 가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78463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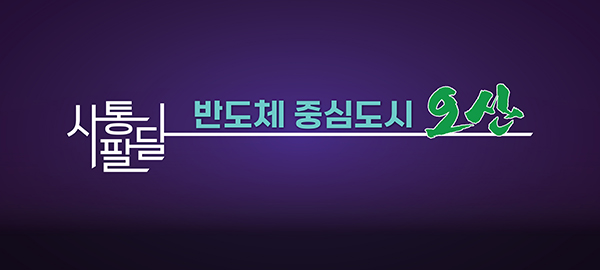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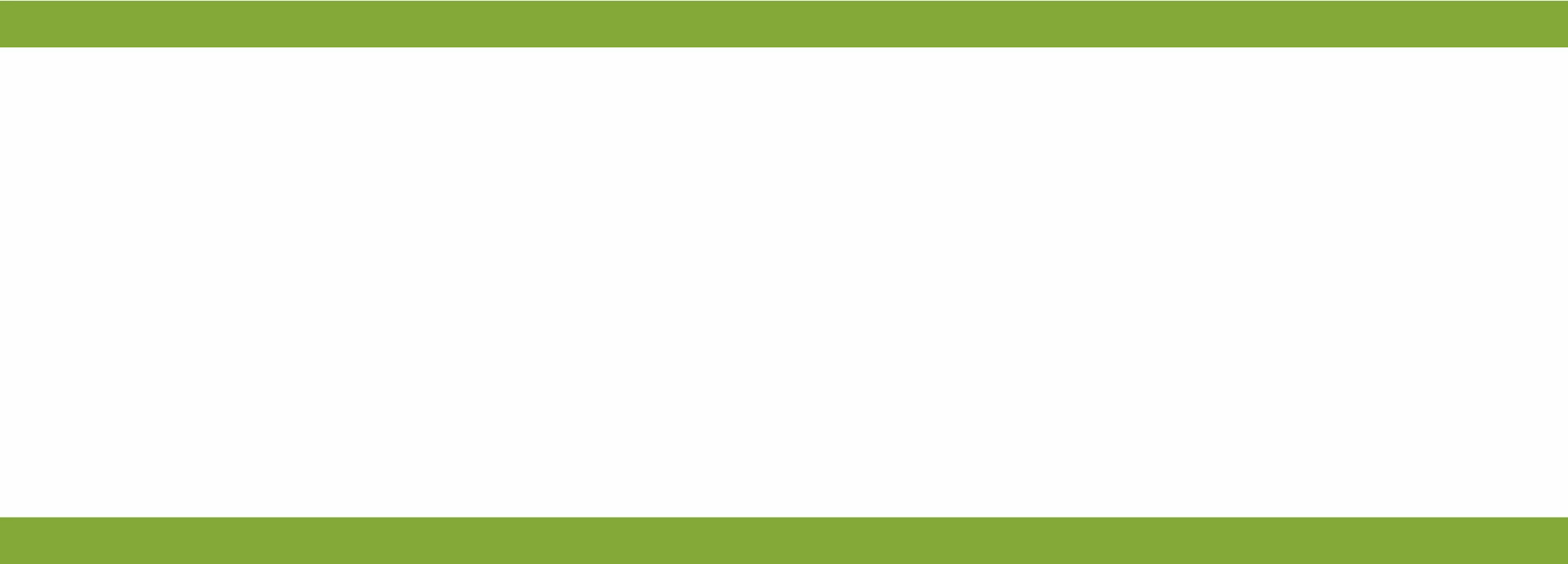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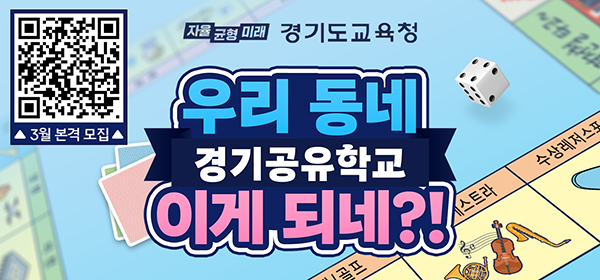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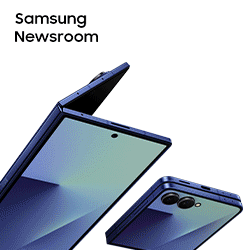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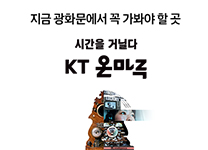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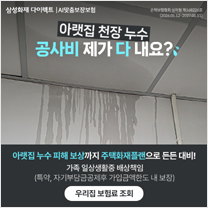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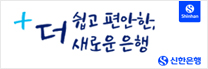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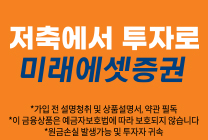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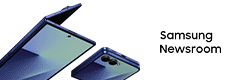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