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연구팀, 단일층 2차원 반도체서 ‘전하 증폭 양자 한계치’ 구현
부산대·성균관대·충북대 공동연구 “같은 양의 빛으로 에너지 생성 두 배 실현 가능성 제시”
 손혜영기자 |
2025.07.29 13:44:07
손혜영기자 |
2025.07.29 13:44:07

국내 연구진이 기존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물리현상을 실험과 이론으로 동시에 입증하며,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및 양자 광전 소자 기술 개발의 중요한 기반을 제시했다.
부산대학교는 물리학과 김지희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김영국 교수, 충북대 방준혁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단일층 2차원 반도체인 ‘이셀렌화 몰리브덴(MoSe2)’에서 이론적 한계치인 최대 전하 증폭(carrier multiplication) 효율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물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하 증폭’은 하나의 광자에 의해 2개 이상의 전자-정공 쌍이 생성되는 현상으로, 태양전지의 이론적 효율 한계인 쇼클리-퀘이서 한계(약 33%)를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 해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흡수된 에너지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열로 소실되기 때문에 실제 구현이 어려웠다.
이번 연구에서는 펨토초(1조분의 1초) 수준의 초고속 시간·공간 분해 측정 기술을 활용해, MoSe₂단일층에서 빛에 의해 생성된 핫캐리어들이 격자나 결함과의 충돌 없이 수 마이크로미터 거리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탄도 확산(ballistic diffusion)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했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 없는 전하 확산은 전하 증폭이 가능한 최적 조건을 제공하며, 광자 하나가 전하 두 쌍을 생성하는 양자 효율 200% 증폭을 달성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연구팀은 밀도범함수 이론 기반의 전자 구조 계산을 통해, MoSe₂ 단일층에서 전하 증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MoSe₂ 단일층 밴드갭의 두 배 되는 이 특정한 에너지 영역에서 밴드 네스팅과 밸리 대칭성라는 특정 조건을 갖춤으로써, 전하를 증폭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김지희 부산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2차원 반도체가 다른 차원 구조보다 전하 증폭 효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한계치 예상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며 “2차원 소재의 구조적·전자적 특성이 전하 증폭 효율 향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량적 실험과 이론 계산을 통해 동시에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2차원 반도체가 고효율 에너지 변환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향후 차세대 태양전지, 양자 광전 소자, 초고속 센서 및 양자 정보처리 기술 등 다양한 응용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공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머티리얼즈 호라이즌스(Materials Horizons)' 7월 1일자에 게재됐다.



















![[비즈&Art⑪] “교육에 문학을 입히다”…교원그룹의 첫 ‘창작문학 공모전’](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2/art_1766554052_176x135.jpg)


![[이현균 애널리스트 특별기고] 2026년 골프회원권 시장 ‘맑음’…지역별 차별화는 계속](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01/art_1766981973_176x135.jpg)
![[이색사회공헌(65)] 장애인의 든든한 벗…하나금융의 ‘하나로 어우러진 세상’](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6044944_176x135.jpg)

![[뉴스텔링] 우측 깜빡이 켠 국힘…정강정책 ‘기본소득’ 삭제 추진 “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2/art_1766714350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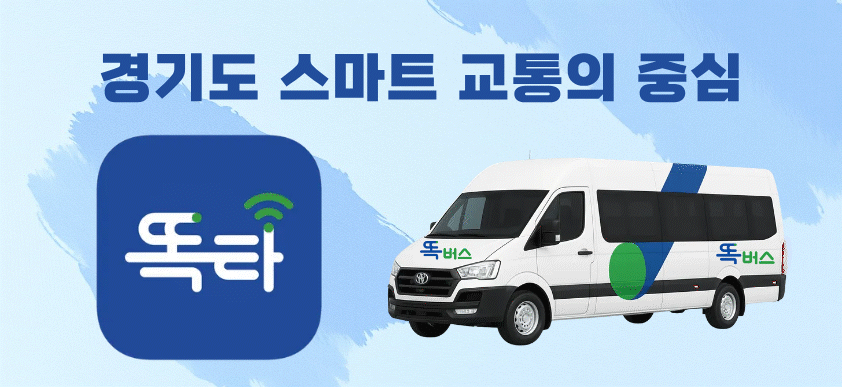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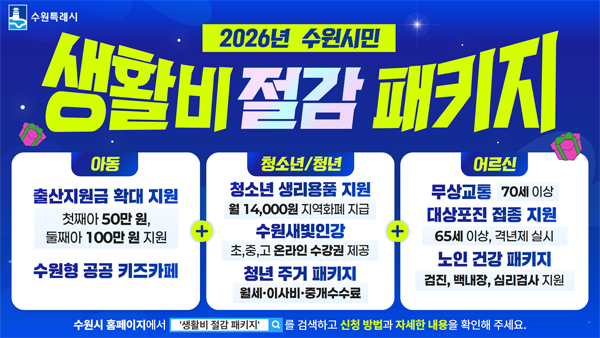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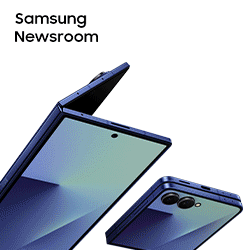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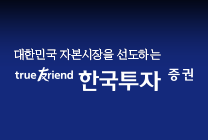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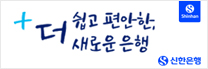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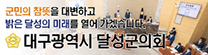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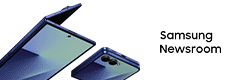
![[비즈&Art⑪] “교육에 문학을 입히다”…교원그룹의 첫 ‘창작문학 공모전’](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2/art_1766554052_78x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