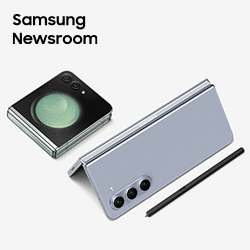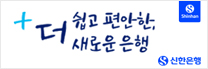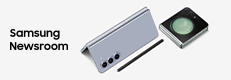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왼쪽부터 나비, 한성우, 곤도유카코 작가가 서울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곤도유카코, 나빈, 이우성, 한성우 작가들이 서울 송현동 이화익갤러리가 4월 2일 막을 올리는 그룹전 'who's room'전을 통해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감성으로 캔버스 위에 풀어내고 있다.
곤도유카코(42)는 전통 민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난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낸다. 한국인과 결혼 후 시댁에서 보냈던 명절 제삿날 음식상과 자신이 일본에서 매일 아침 먹었던 아침 밥상 등이 전시장에 걸렸다.
작가는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음식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떠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곤도유카코, '한가위 제사상'. 51.5x72.5cm, Acrylic on cotton,panel, 2012.(이미지=이화익갤러리)
나빈(본명 김빛나라, 31)은 자신이 일상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장소를 기억으로 떠올리며 소소한 일상이 주는 감성에 주목한다. 만남의 장이 펼쳐진 카페의 책상위에 놓인 흔적들을 통해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소중함을 끄집어낸다.
특히, 다양한 나무 책상에 아로새겨진 나무의 나이테를 연상하며, 자신이 보냈던 시간 속에 흔적을 함축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만남이 있었던 테이블 위에 놓였던 머리핀, 지갑, 핸드폰 등 현장을 그리며, 당시의 기억을 풍경처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각각의 기억에 따라 당시의 모습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다"
작가에게 있어 매우 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경험의 조각들은 캔버스 위에 기억의 재구성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태어나는 것이다.

▲나빈, '개구리 울음소리'. 캔버스에 유채, 90×116.8cm, 2012.(이미지=이화익갤러리)
이우성(31)은 확대된 시각을 통해서 해체 된 인체의 파편적 단면이나 사물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책상위에 놓인 사물들의 흔적을 마치 트윗이나 페이스북의 쪽지 사진처럼 틈틈히 기억나는 것을 상징화 시킨다. 이를 통해 버려지고 남아있는 사물들의 원래 상황을 연상시켜 소모된 자아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회복에 집중한다.

▲한성우, '목공실#3,4'. 캔버스에 유채, 260x388cm, 2014.(이미지=이화익갤러리)
한성우(27)는 학교의 작업실인 '목공실'풍경을 묘사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에 집중한다. 풍경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본 그림이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본 풍경이 되는 것이다. 풍경을 그리돼 언제나 자신의 관점으로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작업을 통해 리얼리티를 찾고 싶었죠, 바닥에 버려진 우연의 흔적을 특별한 의미 없이 바라보지만, 저는 집중해서 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죠"
작가는 익숙한 풍경을 묘사하기 보다는 공간 속에서의 공기 흐름과 분위기, 그 안의 흔적들을 매우 거칠고 자유분방한 터치로 표현한다. 이는 풍경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리기'라는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는 것에 비중을 둔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이자 작가인 설원기 교수가 한예종 출신의 젊은 작가 4인을 통해 진솔한 회화적 어법을 통해서 삶과 예술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태도와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왕진오 기자





















![[CNB뉴스 위클리픽-전자] 삼성·LG전자, ‘2025년 인간공학디자인상’ 대거 수상](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831/art_1754005853_176x135.jpg)


![[연중기획-기업과나눔(168)] 커피향처럼 스며든 나눔…동서식품의 ‘따뜻한’ 동행](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1/art_175386017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