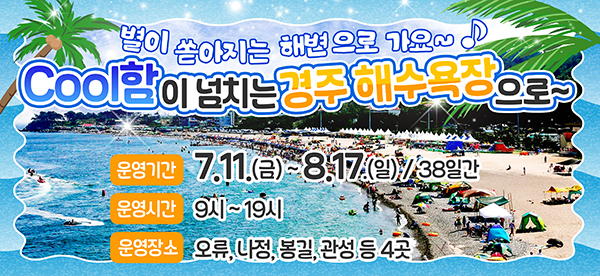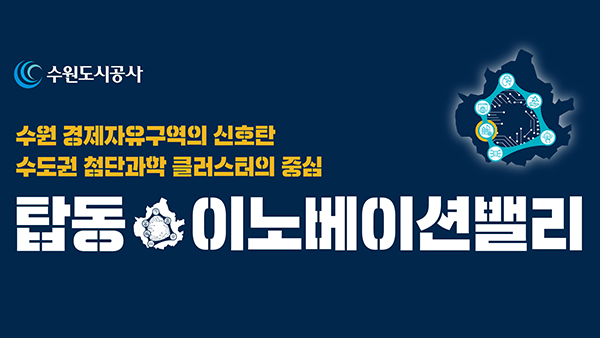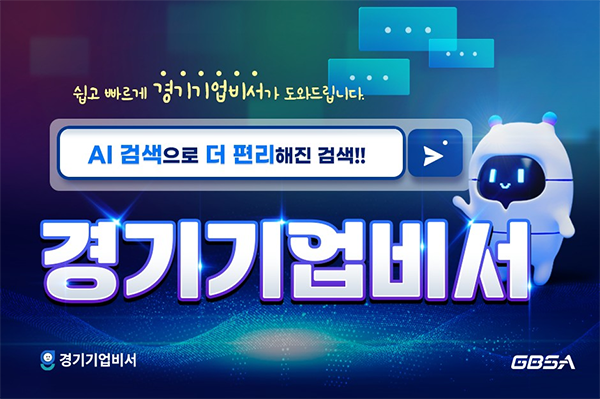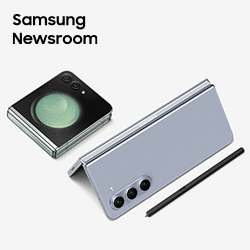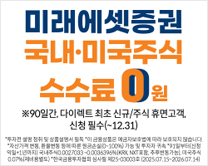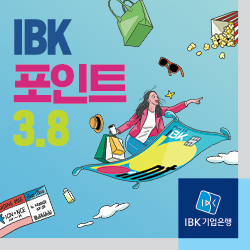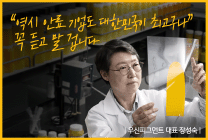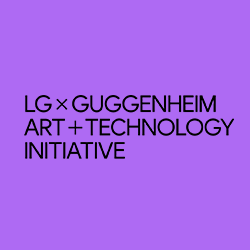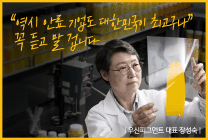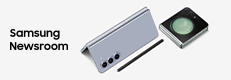와이프가 직장동료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간만에 아이와 둘이서만 공원에 가서 휴일을 보내기로 했다.
와이프가 직장동료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간만에 아이와 둘이서만 공원에 가서 휴일을 보내기로 했다. 옷장에서 보이는 대로 옷을 입혀 데리고나가 신나게 놀았다. 하필 그날 저녁부터 아이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얼음찜질을 해주면서 서로 고성이 오고갔다. 그녀 왈, 찬바람이 부는데도 아이 옷을 얇게 입혀서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얘기다. 감기 바이러스가 이미 며칠 전부터 잠복하고 있던 것인지, 감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열이 나는 것인지 모르는 일이다. 평소 아이와 놀아주는데 인색한 나로서는 염치없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만 보았을 때 내가 맞는 것이다. 와이프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는 어떤 결과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를 이른다. 반면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에 양이나 음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다. 쉽게 말해서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정확히 판별이 어렵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밀(J. S. Mill)은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충족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원인변수의 발생이 결과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둘째,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결과는 원인으로 꼽은 변수만으로 설명 가능해야 하며 다른 변수에 의한 영향은 철저히 배제 되어야 한다.
옷을 얇게 입고 공원에 나간 것이 열이 난 시간보다 앞이니 첫째 조건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근거로 집사람의 논리에 반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넘기면서 말이다.
사실 과학의 성격을 띠는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지식의 핵심은 ‘일반화된 인과관계’다.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과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의 원인변수들을 분석하여 미래의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학문이 지향하는 바다.
학문적으로 중요한 건, 단순한 상관관계들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진짜 인과관계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초의 예상을 벗어난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언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승리한 쪽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 쪽이 못해서’라는 해석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진 쪽에 대한 분석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에 따라, 수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천관리위원장 하는 짓이 미워서’,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이념적 지향이 경직되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면 맞는 얘기겠지만 사담(私談)이 아닌 대중에게 하는 얘기라면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대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엄격한 구별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후해석에 있어서라도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사회과학에 입각한 냉철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 [정세현의 튀는 경제]는 매월 1회 연재됩니다
■ 정세현
현 티볼리컴퍼니(Tivoli Company) 대표, ㈜한우리열린교육 감사
전 삼일PwC Advisory 컨설턴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MBA






















![[구병두의 세상읽기] 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는 ‘관용’과 ‘자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407285_176x135.jpg)
![[CNB뉴스 생생영상] 배틀그라운드 세계관 한곳에…크래프톤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167370_176x135.jpg)
![[보안이 안보여②]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 비상…유통 빅3 ‘보안’ 현주소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4865_176x135.jpg)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도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3인(이상호-장윤선-박현광) 새로 출입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569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