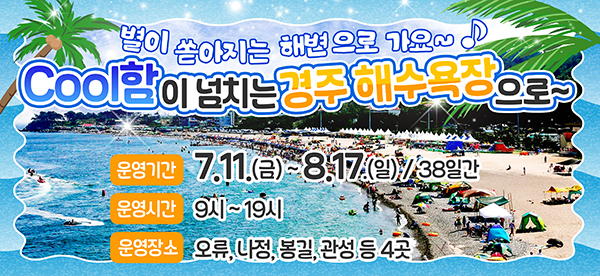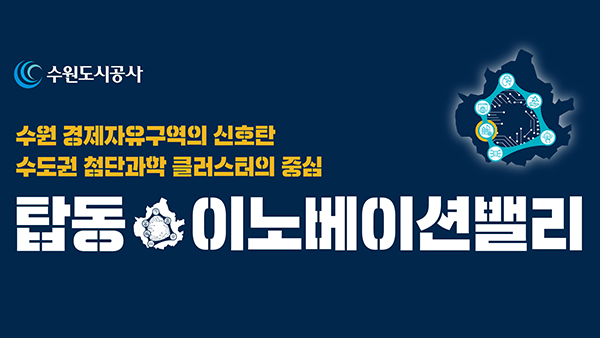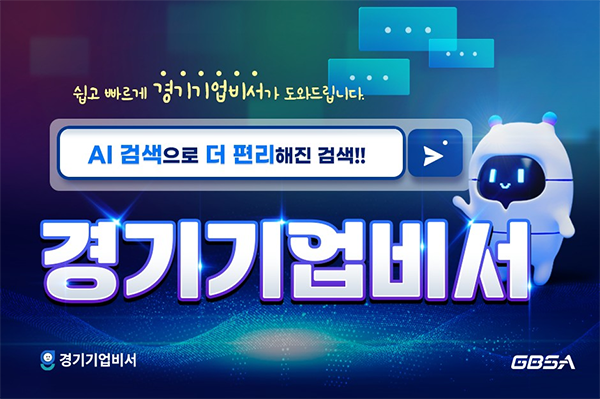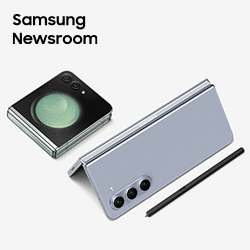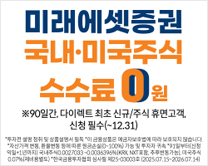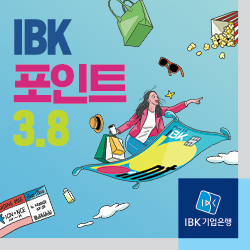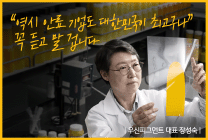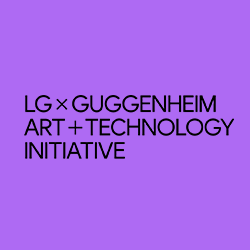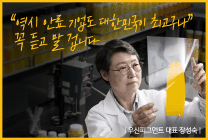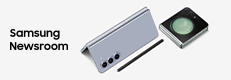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신사임당은 살아생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에 아들 율곡 이이 등 사림세력이 정권을 잡고 신사임당을 존중하면서 부각 되었다. 본인의 관점에서 역사상 저평가되었다는 인물에 대해 쓰시오.’
‘신사임당은 살아생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에 아들 율곡 이이 등 사림세력이 정권을 잡고 신사임당을 존중하면서 부각 되었다. 본인의 관점에서 역사상 저평가되었다는 인물에 대해 쓰시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미국 탄생의 토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약탈, 노예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위 문제들은 대학교 교양과목 시험 문제 같지만, 국내 대기업에서 출제한 입사 문제다. 인문학이 붐을 타면서 회사에 들어가는데도 여러 지식을 묻고 있다.
직접 답을 작성해보려고 하면 그리 녹녹하지 않은 난이도의 과제들이다. 바야흐로 인문학적 지식 없이는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다.
하지만 정작 인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깊게 공부한 이들은 취업시장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구론: 인문계 출신의 90%는 논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같은 자조적인 말들이 나온다.
기업들이 이렇듯 인문학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
첫째, 인문학도 영어, 학점과 같은 스펙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의 트렌드상 인문학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다.
둘째, 인문학의 근간인 ‘비판적 사고’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인 것에 반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의 영역으로 삼는다.
이의 바탕에는 기존 질서를 의심하고 자유롭게 비판하는 정신이 깃들여 있다. 보수적인 문화가 주류인 국내기업에서 환영할 대상은 아니다.
얼마 전 인문학 붐을 타고 인기를 얻은 사교육 강사가 방송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다.
엉뚱한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방송에서 엉뚱한 설(說)을 풀었다. 방청객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고 시청률은 올라갔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 인문학의 현 주소이다. 하나의 멋으로 유행, 소비하고 바로 퇴장시키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다.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비판적 사고의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가?
* [정세현의 튀는 경제]는 매월 1회 연재됩니다
■ 정세현
현 티볼리컴퍼니(Tivoli Company) 대표, ㈜한우리열린교육 감사
전 삼일회계법인PwC Advisory 컨설턴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MBA






















![[구병두의 세상읽기] 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는 ‘관용’과 ‘자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407285_176x135.jpg)
![[CNB뉴스 생생영상] 배틀그라운드 세계관 한곳에…크래프톤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167370_176x135.jpg)
![[보안이 안보여②]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 비상…유통 빅3 ‘보안’ 현주소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4865_176x135.jpg)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도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3인(이상호-장윤선-박현광) 새로 출입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569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