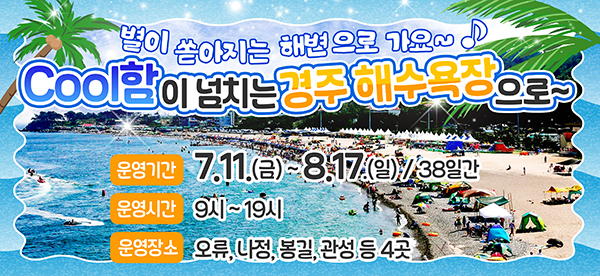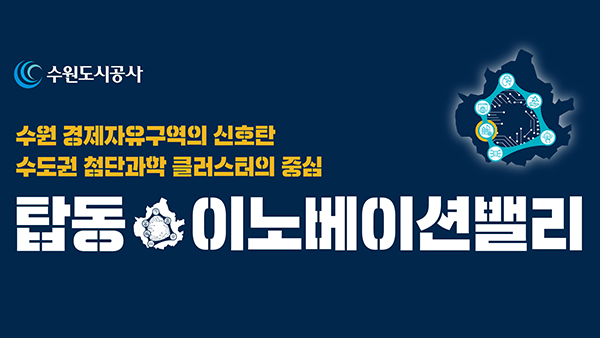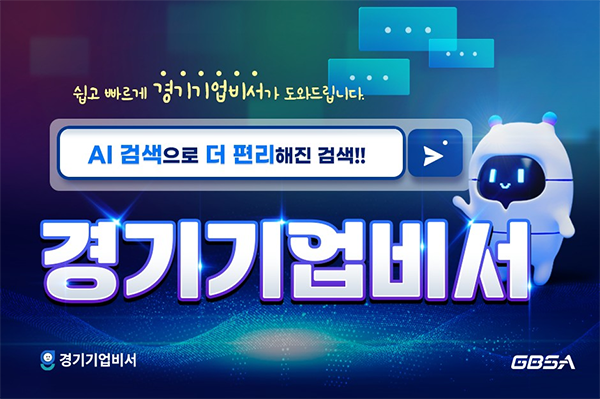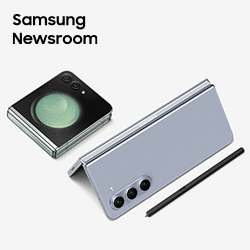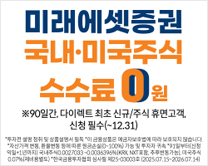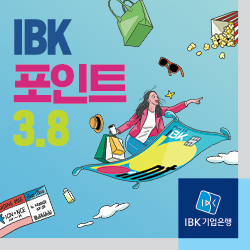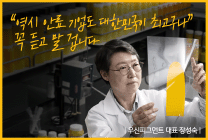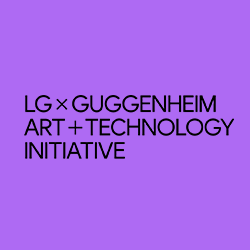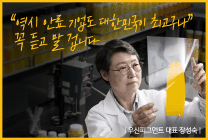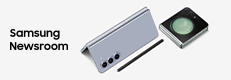SNS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던 교수가 있다.
SNS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던 교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향후 정치참여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정색을 하며 부인했다. 본인은 건전한 비판자 역할로서 만족한다고. 별다른 해명 없이 그는 현재 국회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치보다는 시민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시민운동가의 길을 설파하시던 분도 갑작스럽게 선거에 나가셨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지 절대 정치가 아니라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남기셨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이 분의 대부분 활동은 본인 정치력 배가에 몰두하는 느낌이다.
정치인을 싸잡아 비판하며 가장 비정치적인 사람임을 표명하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공식으로 굳혀져 가고 있다.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봐라봐야 할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은 세계 경제대통령이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다. 한번은 국제금융회의에서 경기(景氣)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는 식으로 피해나갔다.
이튿날 <뉴욕타임스>는 ‘그린스펀, 침체 가능성 경고’라고 보도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그린스펀, 침체 가능성 낮다고 결론’이라는 정반대의 보도를 했다. 그린스펀은 이를 보고 ‘전략적 모호성’이 먹혔다고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출권력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정치무대 데뷔는 필연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간을 짧게 만든다. 알리고 싶어 하는 일면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게 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타고 정치권에 들어온다. 시간이 지나 진짜 모습이 노출되면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늘어만 간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악순환이다.
 공적 이슈를 다루는 업(業)에 종사하는 이들은 ‘향후 정치권 진출에 대한 의향’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감출 문제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피선거권은 모든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공적 이슈를 다루는 업(業)에 종사하는 이들은 ‘향후 정치권 진출에 대한 의향’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감출 문제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피선거권은 모든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린이 위인전까지 출간된 분도 대선시계가 본격 돌아가는 이제는 분명히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기름장어’는 절대 대중정치인에게 호감의 애칭은 아니다.
반(半)만 보여주는 기(奇)발한 방법으로 문(門)을 들어가겠다거나, 반짝 기운을 업고 문을 통과하겠다는 주변의 얕은 꼼수나 책략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진짜 뜻이 있다면 말이다.
* [정세현의 튀는 경제]는 매월 1회 연재됩니다
■ 정세현 (문제해결 전문가)
현 티볼리컴퍼니(Tivoli Company) 대표, 현 ㈜한우리열린교육 감사
전 삼일회계법인 PwC Advisory 컨설턴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MBA






















![[구병두의 세상읽기] 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는 ‘관용’과 ‘자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407285_176x135.jpg)
![[CNB뉴스 생생영상] 배틀그라운드 세계관 한곳에…크래프톤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167370_176x135.jpg)
![[보안이 안보여②]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 비상…유통 빅3 ‘보안’ 현주소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4865_176x135.jpg)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도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3인(이상호-장윤선-박현광) 새로 출입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569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