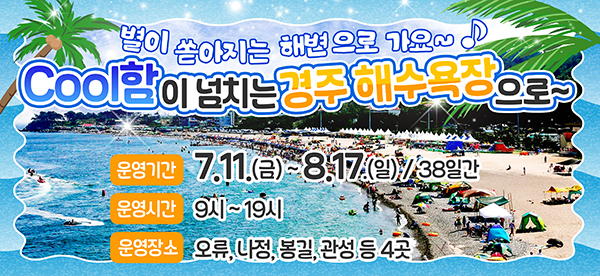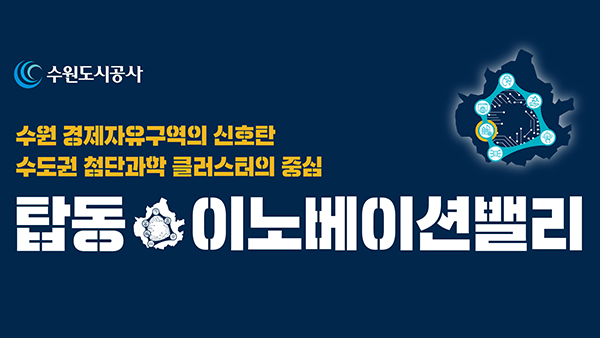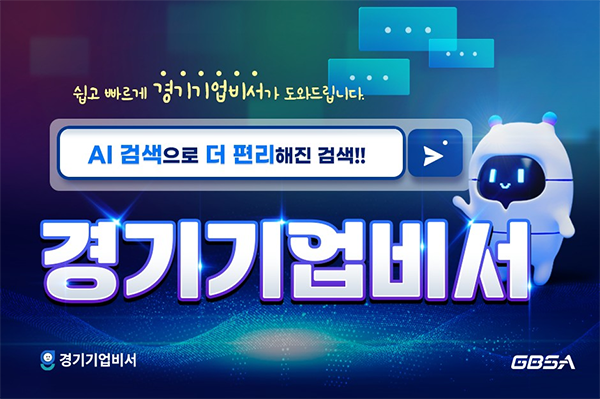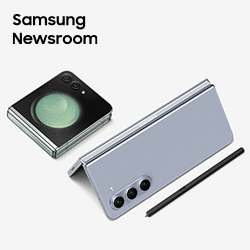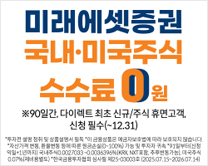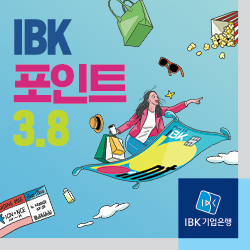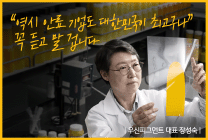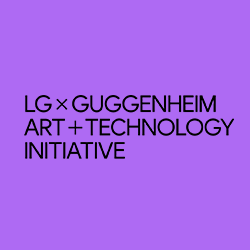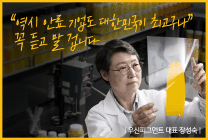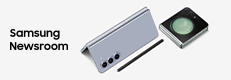즐겨듣는 음원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취향의 곡으로 선별되어 있는 음악을 듣다가 놀랐다. 앱에서 알아서 선별해 놓은 곡들이 대부분 내 귀에 꽂혔다. 이를 두고 주변 지인은 4차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즐겨듣는 음원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취향의 곡으로 선별되어 있는 음악을 듣다가 놀랐다. 앱에서 알아서 선별해 놓은 곡들이 대부분 내 귀에 꽂혔다. 이를 두고 주변 지인은 4차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AI(인공지능)나 개념이 확장된 4차산업혁명은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됐다. 그런데 과연 ‘혁명’이라 부를 만한 어제와는 다른 세상이 도래한 것일까?
사실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립된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아직 없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2011년에 독일 정부는 이미 ‘인더스트리 4.0(제조업 4.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개념을 사용했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무슨 4차산업혁명이냐, 아직 3차산업혁명의 진행 단계 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1760년대 1차산업혁명은 석탄과 증기기관을 에너지로 하여 대량생산 시대를 열고 철도, 인쇄술, 대중 교육 등이 결합되었다. 1860년대에는 2차산업혁명으로 전기와 석유를 에너지로, 전신·전화·방송 등 전자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분자생물학 등의 발전을 이루는 3차산업혁명이 등장했다고 한다.
2016년에 4차산업혁명의 화두를 본격적으로 던진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은 4차산업혁명이 속도,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의 측면에서 3차산업혁명과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4차산업혁명을 기존의 산업혁명들과 비교했을 때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각 변동 수준이라고까지 보았다. 게다가 지난 산업혁명과 달리 새로운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파급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몇 번을 읽어봐도 그 차이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필자 만이 아닐 것이다. 미 대륙 서부에 금이 무제한으로 묻혀있다고 몰린 골드러쉬의 광풍 속에서 최대 수혜자는 청바지 회사였고 1999년 Y2K의 허황된 공포분위기 속에서 실속을 챙긴 것은 IT업체들이었다. 이런 불편함이 이번에도 여실히 느껴진다.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선전전 뒤에는 빅데이타를 위하여 서버 용량을 늘리라는, AI(인공지능) 실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업체의 마케팅이 교묘하게 녹아져 있다. 이를 언론과 컨설팅 업체들, 그리고 각종 컨퍼런스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혁명, 패러다임 쉬프트, 스나미 등의 호들갑 그만 떨었으면 한다. 그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이, 조금 더 빠른 처리속도로, 조금 더 기계의 손을 빌어 처리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
* [정세현의 튀는 경제]는 매월 1회 연재됩니다
■ 정세현 (문제해결 전문가)
현 티볼리컴퍼니 대표, 한우리열린교육 감사
전 삼일회계법인 PwC Advisory 컨설턴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MBA






















![[구병두의 세상읽기] 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는 ‘관용’과 ‘자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407285_176x135.jpg)
![[CNB뉴스 생생영상] 배틀그라운드 세계관 한곳에…크래프톤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167370_176x135.jpg)
![[보안이 안보여②]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 비상…유통 빅3 ‘보안’ 현주소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4865_176x135.jpg)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도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3인(이상호-장윤선-박현광) 새로 출입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5693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