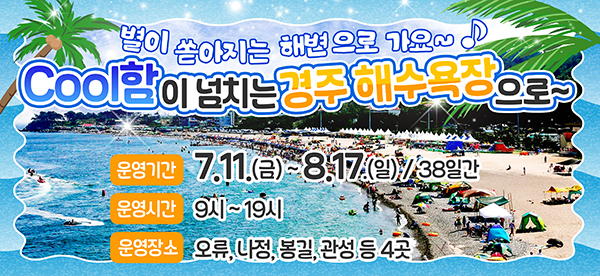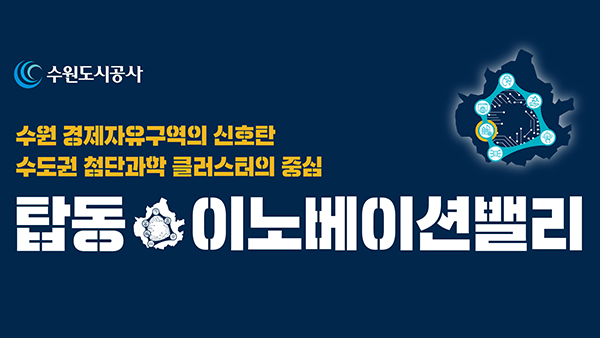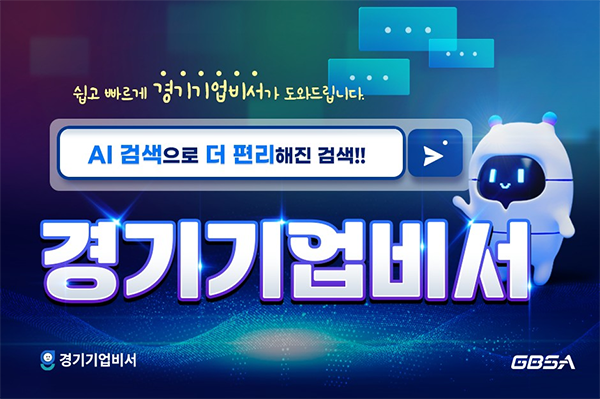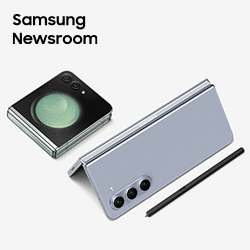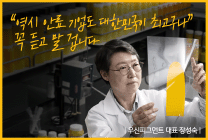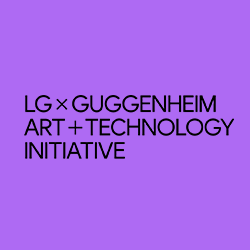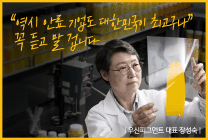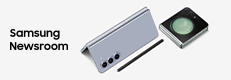지난해 11월4일, 한 일간지에 '비염을 앓고 있는 여대생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1환에 7만원하는 공진단을 대량으로 처방, 조제한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난 적이 있다.
필자도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심히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몰지각한 의료인 보다 아직은 정통 한의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양심적인 한의사가 더 많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게다가 X황제공진원, 가미공진단, 가감공진단, 특공단 등 '공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처방들이 인터넷 광고에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TV홈쇼핑 광고에서는 '황제가 복용한 약'이라고 소개하면서 'X황제공진원'이란 상품의 건강식품을 아무에게나 판매하기도 한다.
도대체 공진단이 무슨 약이기에 이 지경이 됐나?
◇동의보감 공진단 제조법과 복용법
'동의보감 공진단'은 1제(10일분)가 녹용(150g−32%)·당귀(150g−32%)·산수유(150g−32%) 각 4냥(150g), 사향 5돈(18.75g−4%)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녹용, 당귀, 산수유는 군약 역할을 하면서 각각 32%를 차지해 합이 96%가 된다.
사향은 신약을 따르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좌약, 사약으로 4%를 차지한다.
공진단의 제환법은 '술을 넣고 쑨 밀가루 풀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씨(일반적인 환약크기)만하게 환약을 만든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공진단을 만들면 풀은 건조되면서 없어져 환약의 무게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술을 넣고 쑨 밀가루 풀로 공진단을 만드는 것은 약의 구성비 즉, 군약과 좌·사약에 영향을 주지 않음과 복용시 체내 흡수율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복용방법도 데운 술이나 소금을 넣고 끓인 물로 한번에 70~100환씩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복용해야 하부에 있는 한의학적인 개념의 장기인 간에 약이 작용하게 된다.
◇황제가 복용했다는 'X황제공진단'
건강식품인 'X황제공진원'을 분석해 봤다. 그랬더니 황제공진원 1환(4.5g) 중 ①벌꿀 39%(1.755g), ②당귀 15%(0.675g), ③녹용 11%(0.495g), ④홍삼농축액 9%(0.405g), ⑤숙지황 9%(0.405g), ⑥산수유 7%(0.315g), ⑦산약 3%(0.135g), ⑧복령 3%(0.135g), ⑨침향 2%(0.090g), ⑩백수오 1%(0.045g), ⑪대추 1%(0.045g)였다.
충격적이다. 그래도 한의학박사까지 공부한 의료인이 나와서 하는 광고인데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건강식품을 만드는줄 알았다. 그러나 이게 무엇인가?
한의학원전과는 거리가 먼 엉터리 건강식품이 나와서 한의학원전의 '공진'이란 용어를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주효능을 발휘하는 군약의 개념이 되는 녹용, 당귀, 산수유는 엉망으로 배합하고 ①벌꿀이 주재료가 됐다. 벌꿀도 필자가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쓸 약제가 아니다. 벌꿀이 주재료가 된 이유는 무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벌꿀이 주재료가 돼 군약이 되면 이름을 '벌꿀XXX'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게다가 4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 무려 11가지로 늘어났다. 이는 한의학원전을 거들먹거릴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저 아무 것도 아닌 잡방일 뿐이다.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②당귀다. 당귀의 한의학적 수치법제방법은 대략 16가지다.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제대로 수치법제는 했는지 궁금하다.
③녹용도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보면 녹각, 즉 가짜 녹용이 아닌가? 게다가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한의학적으로 수치법제는 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
④홍삼농축액 역시 동의보감 기준으로 보면 병을 소탕하고 치료하는 탕액으로서의 가치도 없어 기록조차 돼 있지 않은 홍삼이 아닌가.
⑤숙지황도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어떤 숙지황을 썼는지?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이런 종류의 건강식품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고 싶다.
⑥산수유도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어떤 산수유를 썼는지?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제대로 수치법제는 했는지?
⑦산약도 그냥 쓸 약제가 아니다.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한의학적으로 수치법제해 부작용을 없애고 썼는지 알 수가 없다.
⑧복령도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어떤 복령을 썼는지?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제대로 수치법제는 했는지?
⑨침향도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사향이 없으면 왜 사향을 대신하는 용뇌향을 쓰지 않고 침향을 썼는지? 침향은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환자의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건강식품에 넣어 써도 되는지? 게다가 원방의 사향의 사용량은 4%인데 그보다 약력이 약한 침향으로 바꾸면서 2%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침향의 가격은 g당 가격이 200원 정도에 불과한 약제다. 위의 건강식품 1환당 0.09g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단돈 몇십원 정도다. 의서에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사향 대신 침향을 써놓고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려고 '만일 침향이 가짜면 전액 환불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⑩백수오도 함부로 쓸 약제가 아니다.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한의학적으로 수치법제해 암수 한쌍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⑪대추의 등급은 5가지다. 위에 사용된 건강식품에는 어떤 대추를 썼는지?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제대로 수치법제는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필자가 'X황제공진원'을 살펴봤지만 정말 실망을 느낀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임신금기약인 금박까지 입힌 공진단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할 잡탕이 유통되면서 한의학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황제라니
윗글에서 '동의보감 공진단'과 'X황제공진원'을 살펴봤다. 한의학이 이렇게 왜곡된 것도 필자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황제'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X황제공진원'이란 이름에 '황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천년 전, 중국 문명 시조 중 한사람이자 한의학의 창시자를 '황제'라고 한다. 그와 관련된 책으로는 '황제내경'이 있다. 또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중국 왕조의 왕들도 황제라고 한다. 한의서에서의 '황제'는 한의학의 창시자인 '황제'를 말한다. 한의학을 집대성해 동의보감을 펴낸 허준 선생 조차도 한의학의 창시자인 '황제'를 존경해 함부로 원전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필자는 '중국이 한의학공정을 못하는 이유편'에서 중국의 한의학은 앞의 '4대의가'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나머지 의서에 황제가 복용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건강식품에 함부로 '황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한의학을 무시하고 일반인을 혼동시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동의보감의 4천여개의 기본처방 가운데 1번 처방이 경옥고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경옥고도 왕조의 황제가 복용한 기록이 있으므로 '황제경옥고'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나머지 다른 처방들도 중국 의서에 왕조의 황제가 복용한 기록이 있으면 처방 이름 앞에 '황제'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기회에 필자는 비록 건강식품명에 '황제'라는 글자가 들어가더라도 '한의학 용어에서 황제는 한의학의 창시자인 황제를 이야기함'을 알린다. 중국 왕조의 황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동의보감 공진단'과 '동의보감 쌍화탕'
동의보감 원문에 '■쌍화탕(雙和湯)−(허로문25)은 정신과 기운이 다 피로하고 기운과 혈이 다 상한 것과 혹은 성생활을 한 뒤에 몹시 힘든 일을 하거나 몹시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성생활을 하는 것과 중병을 앓은 뒤에 몸이 허약해지고 피로해 기운이 약해진 것과 저절로 땀이 나는 것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治心·力俱勞, 氣·血皆傷, 或房室後·勞役, 或勞役後·犯房, 及大病後虛勞, 氣乏·自汗等證)'
'백작약(초부−102) 2돈 반(9.375g), 숙지황(초부−12)·황기(초부−51)·당귀(초부−97)·천궁(초부−45) 각 1돈(3.75g), 계피(목부−01)·감초(초부−08) 각 7푼 반(2.81g)(白芍藥二錢半, 熟地黃·黃芪·當歸·川芎 各一錢, 桂皮·甘草 各七分半)을 썰어 1첩으로 해 생강(채부−01) 3쪽(약 5g), 대추(과부−14) 2개(枚)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右剉, 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일명 쌍화산이라고 하는데 건중탕(허로문−75)과 사물탕(혈문)을 합한 것이다. 어떤 처방에는 중병을 앓고 난 뒤에 몸이 허약해지고 피로해 기운이 약해진데 가장 효과가 좋다고 했다.(一名雙和散, 乃建中湯·四物湯合爲. 一方, 大病後, 虛勞·氣乏, 最效)(제방)'고 기록돼 있다.
◇허준선생이 동의보감을 펴낸 이유
필자는 '동의보감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제들을 설명하면서 '동의보감 쌍화탕이 공진단 보다 효능이 낫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동의보감 쌍화탕은 다섯 기운(오장)이 다 허약한 경우, 즉 음기와 양기가 다 허약한 경우에 쓰는 처방으로 사용 범위가 넓다. 게다가 약제를 구하기 쉬운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진단은 그렇지 못하다. 앞편에서도 설명했지만 공진단은 첫째 기운(간장)이 허약한 경우에 쓰는 처방으로 사용 범위가 좁다. 공진단 원방에 들어가는 사향은 멸종위기 동·식물(CITES) 1급에 속하는 사향노루에서 나오는 약제다. 지금 수입되는 사향은 화장품과 한약처방, 공진단 등에 사용된다. 수입되는 사향 전량을 공진단을 만드는데만 쓴다고 해도 약 750제, 즉 성인 750명이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처에 공진단이 나돌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필자는 멸종위기 동·식물(CITES) 1급인 사향노루의 멸종을 막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허로치료제(보약)로 사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일 수입되는 사향이 있다면 '동의보감 우황청심원이나 사향소합원' 같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데 써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자가 첫째 기운(간장)이 허약한 경우에는 '허로문(도표참조)의 46번 처방인 공진단'과 효능이 같은 '허로문의 44번 처방인 흑원, 45번 처방인 귀용원, 47번 처방인 자보양영환' 등이 있기 때문이다.
허준선생이 동의보감을 펴낸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동의보감이라고 일컬어지는 본초강목이란 책은 여러 의가의 학설을 마구잡이로 기록함으로써 갖가지 폐단을 만들었다. 논설만 분분할 뿐 처방의 핵심과 본뜻은 알아듣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서 속에 나타난 1천892가지 약제 중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필자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라져가는 우리 탕액(약제)을 복원시키면서 녹용이나 침향, 서각 등 고가약이나 희귀약재로 처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하기 쉽고 치료효과도 좋은 탕액으로 서민과 친숙한 치료의학으로 우리 한의학이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협회·학계 나서서 정리해야
윗글에서 살펴봤지만 건강식품산업을 과연 누가 이렇게 문란하게 만들었는가?
만일 이렇게 한의학을 문란케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숙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의협이나 유관단체에서는 '유네스코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2013년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내후년에 기념식이나 축하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한의학 원전을 도용하고 폄훼한 건강식품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마치 '치료의학이 아닌, 보약 위주의 부자들을 위한 의학'으로 인식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동의보감이 어떤 책인가? 한의학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윗글에서 지적한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그러므로 국가가 관심을 가져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협회나 학계에서 발벗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억지 트집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2013년 '동의보감 유네스코 기념의 해'를 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의학이 비과학적이고 엉터리'라고 한의학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진단과 황제공진원 구성 비교
▲공진단(4.5g 중)
녹용 4냥(32%−150g) 1.44g, 당귀 4냥(32%−150g) 1.44g, 산수유 4냥(32%−150g) 1.44g, 사향 5돈(4%−18.75g) 0.18g
▲황제공진원 1환(4.5g 중)
벌꿀 39%(1.755g), 당귀 15%(0.675g), 녹용 11%(0.495g), 홍삼농축액 9%(0.405g), 숙지황 9%(0.405g), 산수유 7%(0.315g), 산약 3%(0.135g), 복령 3%(0.135g), 침향 2%(0.090g), 백수오 1%(0.045g), 대추 1%(0.045g)
다음 글에는 '동의보감 출간 배경'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프로필>
1987년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1회 졸업
1987년~현재 대구 인제한의원 원장
2011년 ‘물고기 동의보감’ 출간
























![[우상결] “빠르게 더 빠르게”…불붙은 유통가 퀵커머스 경쟁](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2125949_176x135.jpg)


![[우상결] R&D 경쟁력 입증 제약업계…하반기 승부수도 '연구개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2194712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