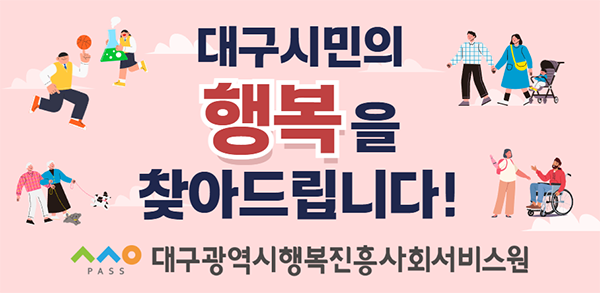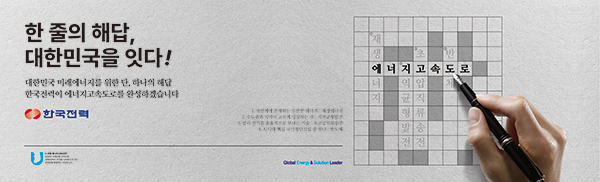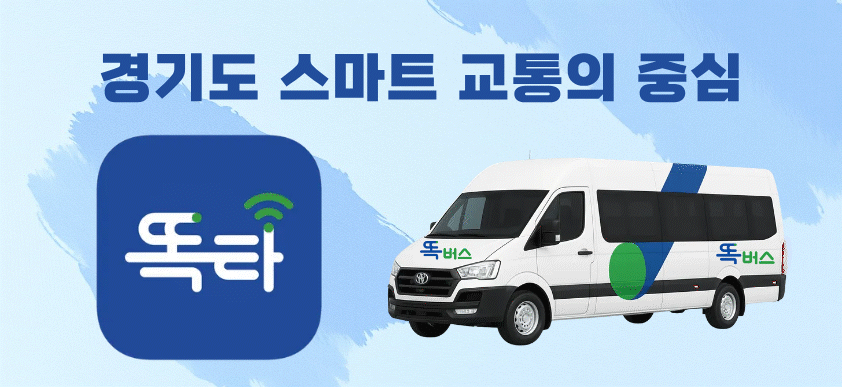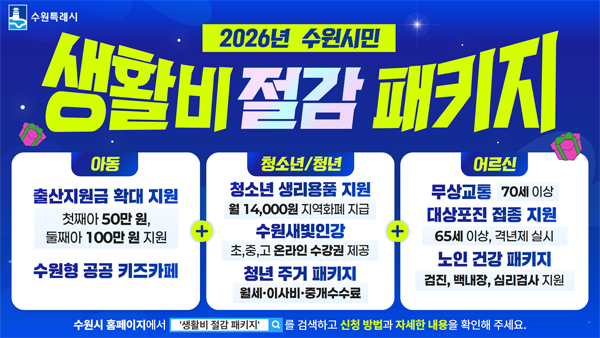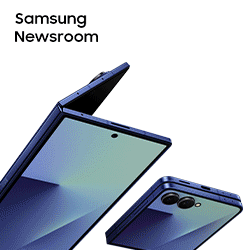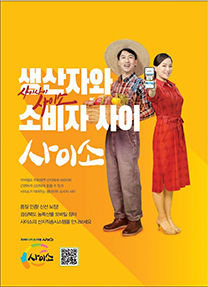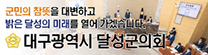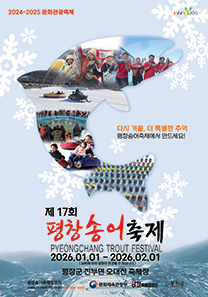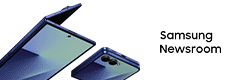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낮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가하면, 정부에서는 ‘원가주의’에 따라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발전사로부터 156원(/kwh)의 전력구입단가로 전력을 사들인 반면, 같은 기간 주요 대기업들은 100원(/kwh) 미만의 낮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최대의 전력사용기업인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97.22원(/kwh)의 단가로 전기를 사용해 1분기 기준 최소 2786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렸으며,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도 각각 kwh당 96.72원, 102.97원, 96.68원, 96.73원의 가격으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 최소 1758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
그는 “한전 적자의 본질적 원인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며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결국 공공기관인 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대신 떠안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유가 폭등으로 인해 전력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전 적자가 커진 반면, 대기업들은 유가 폭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같은 논리로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를 확립해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원가주의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이 그대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85.9원(/kwh)이었고, 2021년에는 102원(/kwh)이었다. 올해 1분기의 156원(/kwh)은 전년 대비 약 52% 급등한 금액이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제철·반도체·정유화학 기업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역시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1.5배 오른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력 구매 구조 개혁·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할까?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개인이 적절한 비율로 연료비 상승 부담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독일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먼저, 현재 한전의 전력구매 구조를 살펴보면, 한전은 남동·중부·동서·서부·남부 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와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대형 민간발전사들, 그리고 중소·개인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모두 사들여 수요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문제는 한전이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해당 거래시간의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 때문에 한전은 무조건 가장 비싼 가격에 전기를 구매하고, 민간발전사들은 무조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이 5조2861억원의 적자를 내는 동안 주요 민간발전사들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하는 이유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공급가격 등락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는 각종 글로벌 이슈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오르내린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후, 계절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글로벌 LNG 가격이 상승해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졌지만, 독일은 그간 늘려온 막대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부족분을 대체하고 있다. 발전량 조절이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특징 때문에 여유분이 생길 때는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고, 부족할 때는 수입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
독일은 2020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4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원전 등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춘다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정의식 기자)





















![[기자수첩] 생방 나선 대통령과 당하는 공직자+기자… 쥐-바퀴벌레 튀는 소리?](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1/art_1766109774_176x1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