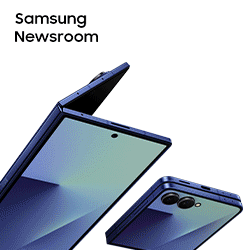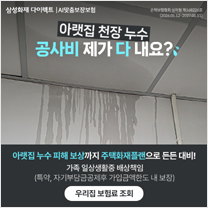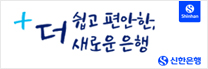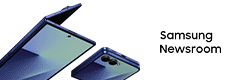평생 안 하던 짓을 하려고 들면, 드는 생각은 하나다. 되게 하기 싫다. 거북한 거부감이 든다. 난생처음 무언가를 시도하려 하면, 누군가 달팽이관에 대고 말한다. “애먼 짓 하지 말라고! 하던 대로 하고 살라고! 그만 좀 내버려 두라고!” 현상 유지에 길들여진 목소리가 저 안에서 울린다. 엇나가려는 중2 아들 붙잡듯이 간곡하게 뜯어말리는 건 다름 아닌 나다.
어떻게 살면 편한지, 행복한지 잘 알아서 그렇다. 살아오면서 누적된 데이터베이스가 많다. 불편함은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탑재됐다. 그때 그때 최고의 선택을 도출해낸다. 간밤에 배고플 때가 적절한 예다. 야식으로 치킨을 시키면 체중에 해롭다는 걸 안다. 그래도 구태여 배달앱을 켜고 주문해서 먹는다. 결과는 상당히 좋다. 만족도 최상이다. 배가 나오는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찰나에 저당 잡히지 않는 삶이 곧 행복이다.
먹고 싸고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일상을 바꿔보려 한 건 신인류처럼 나타난 유쾌한 ‘관종’들 때문이었다. 요즘말로 미닝 아웃(Meaning out)이라고 했다. 신념있는 소비를 한 뒤 자랑스레 내보이는 행위를 일컫는단다. 이를 테면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 가능한 빨대를 쓰는 모습을 SNS를 통해 자랑한다. 그게 요즘의 멋스러움이다.
통장이 양반댁의 돌쇠 입처럼 가벼우니 플렉스는 어렵다. 타고난 멋도 없으니 스웨그는 사치다. 이 둘에 비하면 미닝 아웃은 할 만하다. 여럿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렇게 처음으로 한동안 채식을 해봤다. 환경보호, 동물복지 같은 말도 위대해 보였지만 고기를 끊으면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고 하니 더더욱 끌렸다.
막상 시작하려니 ‘되게 하기 싫어’ 병이 도졌다. 기간을 두고 한참 고민했다. 하루만 한다고 할까? 아니야, 사람들이 욕할 거야. 고작 그걸로 뭘 안다고. 그럼 사흘만? 그 또한 짧아 보인다. 스스로와 타협했다. 일주일만 하기로. 6일이나 8일은 불완전하다. 일주일, 어감마저 완벽하다. 딱 좋다.
백문이 불여일식(食) 아니겠는가. 먹었다. 연예계 대표 비건인 배우 임수정 씨처럼 채식용 떡국 만들 정도의 솜씨는 없다. 마트에서 채식주의용 음식이란 표식을 단 간편식을 종류별로 사왔다. 농심, 오뚜기, 동원F&B 같은 국내 식품기업들이 내놓은 제품이 많았다. 냉장고는 꽉 찼는데 지갑은 텅 비었다. 일반 간편식 보다 비싼 건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맛의 착시효과가 났다. 고기를 흉내 낸 콩고기의 싱거움에 연신 물음표를 날리다가 그래 너도 고기구나, 참으로 맛있구나, 하는 미각적 쾌감에 도달했다.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몸이 정화되는, 풍문으로 들은 기분을 느꼈다. 잠자리가 가벼워 숙면도 취하게 됐다. 단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환경에도 동물에도 그리고 내 몸에도 이렇게 이롭다니. 채식이란 참으로 장점 투성이구나!
그런데 참 얄궂다. 일주일간의 체험 직후 읽은 책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30년 이상 기후, 환경, 사회 정의 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친환경 활동의 허상을 짚는다. 특히 모든 미국인이 채식주의자가 되어봤자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2.6% 줄어들 뿐이고, 전 세계인이 동참해도 10% 절감에 그칠 것이란 부분에서 허망함을 느꼈다. 이게 대관절 무슨 소리람.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야채 만두를 씹으며 곰곰 생각해보니 저 문장의 방점은 ‘미미’에 찍혔다. 노력에 비해 결과는 약하다고.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데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데, 그 주장을 바꿔 생각하기로 했다. 변화의 시작은 애초에 작 거 아니겠는가. 야식이 우람한 뱃살이 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희망만을 보고 확신을 갖기로 했다. 첫 발은 미약하나마 변화가 있을 테니까. 채식으로 인해 몸이 깨끗해진 만큼 자연도 정화된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과 고생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지구를 위한다는 믿음으로.
(CNB=선명규 기자)


























![[잇(IT)야기] 삼성전자가 국가대표 ‘수면 개선’에 나선 까닭](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6/art_1770083875_176x135.jpg)
![[게임 인사이드] 신작에 희비 갈린 게임업계…올해도 키는 ‘뉴페이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207/art_1770884888_176x135.jpg)